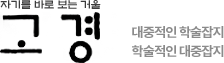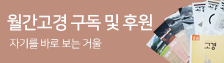[명추회요, 그 숲을 걷다]
공(空)의 자각
페이지 정보
박인석 / 2016 년 4 월 [통권 제36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5,456회 / 댓글0건본문
불교에 나오는 수많은 개념 중에 ‘공(空)’은 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도에서 이 개념이 전래된 이후 중국의 불교도들은 수백 년 간의 세월 동안 ‘공’을 정확히 해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불교의 ‘공’은 실체(實體) 개념을 대치(對治)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 실체에 대한 관념은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인도에서 만물을 창조한 브라흐만과 그것이 인간 속에 내재한 아트만의 특징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실체를 상정하는 이러한 인도적 사고에 대해 ‘공’은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무기로 작용하였다.
‘공’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던 중국의 불교도들은 이 개념을 중국 철학에서 가장 유사한 용어로부터 빌려 쓰고자 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노자』의 ‘무(無)’였다.
비어 있다는 의미의 ‘공’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없다는 뜻의 ‘무’를 대응시켜 본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개념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것인 만큼, 『노자』의 ‘무’는 단지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물의 근원인 ‘도(道)’는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치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생동력 있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따르면, ‘공’을 『노자』의 ‘무’로 이해한 것은 공을 텅 비었다는 원의(原義)보다는 뭔가가 실체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중국의 불교도들은 ‘공’이 어떤 사물을 이동시킨 다음 나타나는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과 사건 그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다 정확히 알게 되었다. 이 세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을 들어 보더라도 그것은 무수한 인(因)과 연(緣)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생기(生起)하는 것이지, 그 속에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를 뜻하는 것임을 분명히 파악하게 된 것이다.
선종에 나타난 공사상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던 시기에 필자는 공이 이른바 교학(敎學)불교에서만 주로 다뤄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개념이 선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 북경(北京)에서 1년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북경대(北京大) 대학원의 불교 강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올해 팔순을 훌쩍 넘긴 루우열(樓宇烈)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것이다. 이 교수님은 원래 중국철학을 전공하다가 후에 중국불교 연구에 매진한 분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학문적 권위를 지닌 분이다.
당시 진행된 강좌는 특별한 형식이 없이 참여한 학생들이 중국불교나 철학 전반에 걸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중 선종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언급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육조혜능 스님께서 오조홍인 대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서 신수 스님과 더불어 게송을 바치는 장면에 대한 것이었다. 필자 역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저 덤덤하게 듣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게송들을 ‘공’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을 듣고 아주 신선한 감동을 받았었다.
신수 스님과 혜능 행자의 게송
『육조단경』을 보면, 오조 스님의 제자들 가운데 학식이 가장 높고 연령 역시 높았던 신수 스님은 깨달음의 경지를 시로써 보라는 오조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보다는 밤에 몰래 건물의 벽에다 적어 두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身是菩提樹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心如明鏡臺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時時勤拂拭
띠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莫使有塵埃
이 게송을 본 뒤 오조 스님은 신수 스님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지은 이 게송은 소견은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게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모름지기 문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성철 스님, 『돈황본 육조단경』) 오조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스님은 이 게송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점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조 스님은 신수 스님에게 게송을 다시 지어 오라고 하였지만, 신수 스님은 끝내 게송을 짓지 못하였다.
그 후 오조 스님 도량에서 많은 스님들이 신수 스님이 지은 게송을 외우자, 당시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던 혜능 행자 역시 그 게송을 듣게 되었다. 게송을 들은 혜능 행자는 생각한 바가 있어서 신수 스님의 게송이 적힌 곳에 이른 뒤 글을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게송을 적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왜냐하면 혜능 행자는 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게송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자무식의 나이 어린 행자였던 혜능의 게송은 다음과 같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菩提本無樹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明鏡亦無臺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니 佛性常淸淨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오. 何處有塵埃
이 게송을 본 오조 스님께서 야반 삼경에 혜능 행자를 조사당 안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해 주셨고, 혜능은 한 번 듣고 말 끝에 문득 깨쳤다. 이에 오조 스님께서 단박에 깨치는 법과 가사를 혜능 행자에게 전하신 뒤, 하산을 명하신다.
공(空)의 자각
아마 『육조단경』뿐 아니라 선종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로 꼽힐 이 내용에 대해 북경대 루우열 교수님은 두 스님의 차이를 ‘공’으로 설명하셨다. 게송을 보면, 신수 스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여 눈앞의 번뇌를 성실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수행자이지만, 번뇌의 정체가 ‘공’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번뇌가 자성(自性, self identity)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털고 닦더라도 그 번뇌를 다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당시 행자였던 혜능 스님은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있으리오.”라고 하여 번뇌의 성품이 본래 텅 빈 것, 다시 말해 ‘공’한 것임을 여실히 자각하고 있었다. 즉 우리의 번뇌 망상이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줄 확실히 자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공에 대한 자각이 선사들의 게송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아주 좋은 계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명추회요』 18권-4판의 ‘일심(一心)만 깨달으면’(141쪽)이라는 제목 아래 이와 뜻이 통하는 문답이 나온다. 이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물음】 중생의 업과(業果)와 종자(種子)의 현행(現行)이 오랜 겁 동안 훈습된 것은 마치 아교와 옻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어째서 일심(一心)만 깨닫기만 하면 단박에 그것을 끊고 성불할 수 있는가?
【답함】 만약 마음과 경계가 실재하고 인(人)과 법(法)이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면 비록 만겁(萬劫)을 수행한다 해도 끝내 도과(道果)를 증득하지 못한다. 만약 무아(無我)를 단박에 깨달아 만물이 공적하다는 것을 깊이 통달하면 능(能)과 소(所)가 함께 소멸할 것인데, 어떻게 증득하
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유하면 마치 미세한 먼지가 사납게 부는 바람에 흩날리고, 가벼운 배가 빠른 물살을 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네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거든요. 무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대낮이라도 무서웠습니다. 산속에 있는 무덤 옆으로야 좀체 지나…
서종택 /
-

‘옛거울古鏡’, 본래면목 그대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불면석佛面石 옆 단풍나무 잎새도 어느새 불그스레 물이 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포행을 마치고 들어오니 책상 위에 2024년 10월호 『고경』(통권 …
원택스님 /
-

구루 린뽀체를 따라서 삼예사원으로
공땅라모를 넘어 설역고원雪域高原 강짼으로 현재 네팔과 티베트 땅을 가르는 고개 중에 ‘공땅라모(Gongtang Lamo, 孔唐拉姆)’라는 아주 높은 고개가 있다. ‘공땅’은 지명이니 ‘공땅…
김규현 /
-

햇살을 솜틀하여 만든 알토란 사찰음식
입동이 들어 있는 달이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11월의 풍광은 아직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무지게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풀과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 털어 냅…
박성희 /
-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없다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二由一有 一亦莫守 흔히들 둘은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가지 변견은 하나 때문에 나며 둘은 하나를 전…
성철스님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