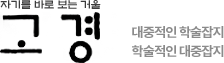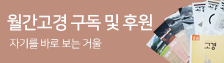[선어록의 뒷골목]
현실은 슬퍼하기에 앞서 넘어서야 할 것들이다
페이지 정보
장웅연 / 2015 년 2 월 [통권 제22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5,762회 / 댓글0건본문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삶이란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비로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다. 이렇듯 사람은 생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삶을 지탱한다.
생각은 이렇듯 중요하지만, 생각의 과잉은 행복의 결핍을 낳는다. 생각이 앞서면 실상(實相)을 놓치고, 생각이 많은 자는 우유부단하다. 생각으로 가득한 삶은 두개골 안에서만 맴돈다. 아무 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자기가 만든 세계 안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알음알이로 이끌어가려는 인생은 옹색하고 매양 다급하다. 지레 겁먹거나 섣불리 나서면서 일생을 그르친다.
생각은 삶을 거스르거나 앞질러 갈 뿐, 삶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오직 죽음만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한 생각 참을 줄 알고 마음 한 번 접을 줄 안다면, 이 세상 어디나 살 만한 곳이다. 단언컨대 모든 현실은 끝내 마음속의 현실이다.
그리고 현실은 현실 이전에 사실이고, 슬퍼하기에 앞서 넘어서야 할 것들이다. 집착이 아닌 집중이 관건이다.
제3칙
동인도 왕이 조사에게 묻다(東印請祖, 동인청조)
동인도의 어느 국왕이 제27조(祖) 반야다라 존자에게 재(齋)를 청하면서 물었다.
왕 : 어찌하여 경(經)을 읽지 않으시오?
반야다라 : 빈도(貧道)는 숨을 들이마실 때 음(陰)과 계(界)에 머물지 않고, 숨을 내쉴 때 뭇 인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것도 읽지 않는 듯해도 백천만억 권의 경을 읽는 셈입니다.
반야다라(般若多羅)는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스승이다. 불교의 초조(初祖)인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진 반야다라의 법을 계승한 제28조 달마는, 중국으로 건너가 독자적인 선법(禪法)을 펼쳤다. 불립문자(不立文字)는 조사선의 알짬 가운데 하나다. ‘문자’란 자잘한 분별부터 온갖 학문과 이념을 아우른다. 곧 깨닫겠다고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숨만 쉴 줄 알아도 부처라는 선언이다.
달마는 말만 번드르르한 겉치레인 의식(儀式)을 매우 싫어했다. 반야다라 역시 문자의 총체이자 진리의 상징으로 갈음되는 경(經)을 부정하고 있다. 천도재(遷度齋)는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한 주문인 동시에, 살아 남은 자를 달래기 위한 주문이다. 그래서 재를 지내려면 경을 읊어야 하는데, 그럴듯한 말 몇 마디에 망자의 신세가 나아질 순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달램’에는 필연적으로 눈가림과 속임이라는 비용이 지불된다. 살아 있는 자는 묵묵히 살아 있음을 살고, 죽은 자는 잠자코 사라져주는 게 생사의 응당한 도리다.
빈도는 ‘덕(德)이 적다’는 뜻으로 스님이 스스로를 낮출 때 쓰는 말이다. 음과 계는 오음(五陰)과 삼계(三界)의 축약이며, 삶은 오음과 삼계로 구성된다. 색(色, 물질) 수(受, 인지) 상(想, 표상) 행(行, 의지) 식(識, 분별)으로 이어지는 망상의 메커니즘이 오음이다. 여자는 애당초 한낱 몸뚱이일 뿐이지만, 오음 때문에 젊고 예쁜 여자가 되고 그래서 갈증을 유발한다. 욕계(欲界, 욕망) 색계(色界, 물질) 무색계(無色界, 영혼)를 지칭하는 삼계는 중생이 살아서 떠도는 세계다. 무색계는 얼핏 고상해보이지만, 사실상 ‘멍 때리고 있음’의 상태다. 생각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잠깐이며, 인간은 죽는 날까지 탐하거나 헐떡이면서 배회하거나 고꾸라진다.
물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간명하다. 달리지 않으면 된다. 아울러 방황하고 싶지 않다면 결정을 빨리 내리면 그만이다. 여러 갈림길 가운데 하나를 택한 뒤에, 뒤돌아보지 않고 느긋하게 걸어가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가지 않은 길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다. 후회할 것도 자책할 것도 없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걷는 것은 위험하다. 지도를 보는 데에만 골몰하다간, 자칫 돌부리에 걸려 나뒹굴 수 있다.
발밑과 눈앞이, 가장 확실한 미래다.
제4칙
부처님이 땅을 가리키다(世尊指地, 세존지지)
세존께서 대중과 더불어 길을 가시다가 돌연 손가락으로 땅바닥을 가리켰다. “여기에 절을 세우라.” 제석(帝釋)이 한 포기 풀을 뽑아 땅에 꽂으면서 아뢰었다. “절을 다 지었습니다.” 세존께서 빙그레 웃으셨다.
절을 뜻하는 한자인 ‘寺(사)’의 유래는 이러하다. <설문해자(說文解字)>는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모습을 그린 ‘멈출 지(止)’와 작업하는 손을 뜻하는 ‘도울 우(又)’를 더한 글자라고 전한다. 결국 사찰의 원초적 의미는 어느 한 장소에 정착해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자못 정적(靜的)이고 담백한 어원이다. 인도에서 온 수행자들의 소박하고 정갈한 일상은, 돈 좋아하고 떠들썩한 현지인들에겐 그야말로 진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절은 조용하다. 조용해야 절이다. 말이 많으면 절이 아니고 흥정이 오가면 절이 아니다. 비난에 덤덤하고 칭찬에 초연해야만 절은 절일 수 있다. 동시에 절은 세속의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물들지 않은 힘으로 세속을 당당히 가르칠 수 있다. 무엇 하나 모범적이지 않고 모양만 절이라면, 그냥 집이다.
절은 성스러운 공간이다. 크고 번쩍이는 부처님이 있어서 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절의 성스러움은 비어 있음에서 움튼다. 적게 먹고 적게 자면서, 많이 먹고 많이 자는 자들의 귀감이 된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대자유가 절을 절답게 만든다. 누구나 못 잡아서 안달을 내는 잉여가치가, 이 안에서는 생판 남의 일이다. 절에 사는 자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함으로써, 인간들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절은 절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절도 절이 아니다. 절은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재미없는 처소여야 한다. 훗날 기어이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릴 이들에게, 삶의 진면목을 똑똑히 일러주려면.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위로하려면.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 것도 아닌 몸짓으로, 꿋꿋이 버티는 절은 거룩하다.
제5칙
청원의 쌀값(淸源米價, 청원미가)
어떤 스님이 청원행사(淸源行思) 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여릉(廬陵)의 쌀값이 얼마나 되던고?”
여릉은 양자강 이남에 위치했다. 오늘날의 지명으론 중국 장시성[江西省] 지안시[吉安市]. 전체 면적의 절반이 산지인 반면, 전형적인 아열대성 기후여서 곡물이 자라기 순조롭다.
청원 선사는 쌀이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오가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쌀값’이란 일상성의 상징이다.
이런저런 인연들과 부대끼며 이러구러 버티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일러주는 대답이다. 산다는 건 이러나저러나 산다는 것이어서, 죽어간다는 것이어서, 아무리 뾰족한 수라도 결국엔 무뎌진다.
살다보면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기어이 안다. 타고난 체형이 그렇고 부모의 신분이 그렇고 연인의 변심이 그렇고 남성형 탈모가 그렇다. 일절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의 유전(流轉) 앞에서, 바꿀 수 없음을 절감하고 되돌릴 수 없음을 탄식한다. 삶은 얼핏 내것 같지만, 삶이 나를 사는 것이다. 끊임없이 들썩거리고 우글거리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쉴 새 없이 뒹굴고 빌어야 하는 실존(實存)은 독하다.
쌀값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조작을 했다간 처벌 받는다. 선사가 말한 쌀값이란 삶의 근본적인 피동성을 의미한다. 시장경제 체제에 던져진 인간의 땀과 피로, 음모와 배신, 타협과 조정의 총량이자 응축이다. 누구나 쌀값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또한 연루되어 있다. 벌어먹든 빌어먹든 밥이 필요한 형편이라면, 쌀값이 부여한 노역과 쌀값이 지정한 처지를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산다. 살아지니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야 하니까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 본분과 책임을 지키기 위해 힘겹고 눈물겹게 제 나름대로 쌀값에 기여하는 중생은, 제아무리 못났어도 부처다. 억지춘향은 곤욕스럽지만, 춘향이는 그래도 예쁘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30여 년 만에 금빛 장엄을 마친 고심원
어느 날 큰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원택아! 내가 이제 장경각에 있는 책장을 열 힘도 없어졌다. 그러니 장경각에 들어가면 책장을 열지 않고도 책을 자유롭게 뽑아 볼 수 있게 장경각을 새로 지어야겠다.…
원택스님 /
-

죽은 뒤에는 소가 되리라
오늘은 친구들과 모처럼 팔공산 내원암 산행을 합니다. 동화사 북서쪽 주차장에 내리니 언덕을 밀고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팔공산 주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팔공산 능선을 바라보면 언제나 가…
서종택 /
-

연꽃에서 태어난 사람 빠드마 삼바바
‘옴 아 훔 바즈라 구루 빠드마 싣디 훔’ ‘마하 구루(Maha Guru)’에게 바치는 만트라(Mantra, 眞言)이다.지난 호에 『바르도 퇴돌』의 출현에 대한 글이 넘쳐서 이번 달로 이어…
김규현 /
-

참선 수행의 무량한 공덕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설사 억천만겁 동안 나의 깊고 묘한 법문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단 하루 동안 도를 닦아 마음을 밝힘만 못하느니라.” 붓다의 참선과 아난의 글&nb…
성철스님 /
-

붓다의 생애와 본생도
우리나라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돈황 벽화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개굴 초기부터 많이 그려졌다. 불교의 영혼불멸, 인과응보, 윤회전생의 교의에 따…
김선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