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다 원효 혜능 성철에게 묻고 듣다 ]
이해와 마음 그리고 돈오 -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
페이지 정보
박태원 / 2025 년 5 월 [통권 제145호] / / 작성일25-05-04 21:18 / 조회16회 / 댓글0건본문
팔정도 해탈 수행은 그 내용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팔정도 수행 항목의 배열 순서에 따르면, ‘이해를 통한 향상 수행(혜학慧學: 정견正見·정사正思)’, ‘행위 단속을 통한 향상 수행(계학戒學: 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 ‘마음을 통한 향상 수행(정학定學: 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이 그것이다. 이를 ‘세 부류의 수행(삼학三學)’이라 부른다. 붓다 자신의 분류다.
해탈 수행은 이해와 마음이 관건이다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이해를 익히는 수행(정견正見)’과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의도를 익히는 수행(정사正思)’을 묶어 ‘이해를 통한 향상 수행(혜학慧學)’으로 삼고,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언어를 익히는 수행(정어正語)’과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행위를 익히는 수행(정업正業)’ 및 ‘사실 그대로에 상응하는 생계유지를 선택하는 수행(정명正命)’을 묶어 ‘행위 단속을 통한 향상 수행(계학戒學)’으로 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을 묶어 ‘선정 수행(정학定學)’으로 분류한 것은 유심히 새겨볼 대목이 있다. ‘선정 수행’에 속하는 수행 항목들을 별도로 묶어 분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수행 항목이 ‘이해’나 ‘행위’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인간 특유의 면모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면모를 ‘마음’이라 본다. 그래서 정학定學을 ‘마음을 통한 향상 수행’이라 풀었다. 또 〈정정진正精進을 왜 마음 수행에 귀속시키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마음 수행’을 관통하는 특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마음의 특이성’을 거론하는 곳에서 다루어 보겠다.

팔정도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에는, 〈인간 특유의 면모 세 가지를 ‘해탈 수행을 가능하게 조건’으로 주목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혜학慧學은 ‘인간 특유의 이해 면모’, 계학戒學은 ‘인간 특유의 행위 면모’, 정학定學은 ‘인간 특유의 마음 면모’를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탈 수행은 이해·행위·마음의 세 가지를 축으로 삼는 셈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해는 ‘행위와 마음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행위는 ‘이해와 마음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마음은 ‘이해와 행위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말 행위(어語)’·‘몸 행위(업業)’·‘생계유지 행위(명命)’가 ‘인간 특유의 행위 면모’일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해와 마음’ 때문이다. 인간의 말과 행동 및 생계 활동은 여타 동식물의 교신 신호와 행동 및 먹이 활동과는 다른 차원의 특징을 지닌다. 이해와 마음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위가 ‘이해와 마음을 일으키는 조건’으로 작용할 때, 그 행위는 ‘이해와 마음에 연루된 인간 특유의 행위’다. 따라서 ‘행위 단속을 통한 향상 수행(계학戒學)’은 결국 ‘행위의 인간적 특성을 발생시키는 이해와 마음의 문제’로 귀속된다.
이렇게 보면, 해탈 수행의 관건은 ‘이해’와 ‘마음’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해와 마음의 특징’ 및 ‘이해와 마음의 차이와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붓다의 법설 및 이를 계승한 교학과 수행론의 수용 내용이 결정된다. 선종 돈오견성의 길을 걷는 행보도 마찬가지다. ‘이해와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돈오 행보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된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관련 주제들을 골라 분수껏 소견을 개진해 본다. 가급적 현재어에 담아 세밀하게 써보려 노력하겠지만, 불교의 지도리[樞]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쉽게 읽히는 내용이 되기는 어렵다.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
생명체가 무엇인가를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차이/특징(相, nimitta)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이 지닌 차이/특징들의 대비對比를 통해 지각이나 경험이라는 현상이 생겨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또 차이/특징에 대한 대응 방식과 내용에 따라 생명체의 환경 적응과 생존 수준이 결정된다. 인간 이외의 생명체는 ‘차이/특징들의 대비’를 본능적 수준에서 감지하여 반응한다. 이에 비해 인간은 ‘차이/특징들의 대비’를 언어적 수준에서 인지하고 대응한다. 유사한 차이/특징을 ‘언어에 담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여 분간하는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이/특징에 대해 인간이 선택한 언어적 대응’에서, 그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해’다.
이해(seeing, understanding)는 현상을 ‘개념의 질서로 파악하는 것’이다. 인간은 현상의 유사한 차이/특징들을 언어에 담아 분류하는데, 그것이 개념이다. 개념은 ‘언어에 담긴 현상의 차이/특징’이다. ‘인간’ ‘동물’ ‘여성’ ‘남성’ ‘한국인’ ‘서양인’은 개념이고, 그들에 대한 구분은 ‘개념에 의한 구분’이다. 엄밀히 말해, 인간은 ‘현상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분류된 현상’을 경험한다. 감관으로 경험하는 하늘과 태양, 달과 별, 인간과 동식물 등 모든 현상과 존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에 의해 개념으로 분류된 것’이다. ‘개념’과 ‘개념에 담긴 현상의 차이/특징 그 자체’가 얼마나 상응하는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언어 인간이 된 이후, 인간의 ‘감관을 통한 모든 경험’은, 어떤 방식과 정도일지라도 언어에 연루되어 있고, 감관 밖으로 나가서 외부 현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상의 차이/특징들을 언어에 담아 개념으로 다루는 생명체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존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에 의해 개념으로 분류된 것’이다. 인간이 이해를 통해 현상들의 법칙을 포착할 수 있는 이유도 언어와 개념 때문이다.
이해로써 파악하는 모든 법칙은 ‘개념들 사이의 질서’다. 그래서 ‘이해’는 언어 인간 특유의 ‘개념에 의한 법칙적 경험’이다. 또한 관점觀點(view, 견해)은 ‘다양한 이해들이 수렴되는 매듭’, 혹은 ‘다양한 이해를 이끄는 향도向導’다. 관점과 이해는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한다. 인간의 괴로움과 안락의 문제를 다루려면, 근원적으로 ‘인간의 관점과 이해’를 주목해야 한다. 인간 특유의 모든 문제는 이해·관점에서 발원하기 때문이다. 붓다가 무명無明(avijjā,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함)을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어와 개념을 통한 인간의 경험을 ‘인지적認知的(cognitive)’이라 부른다면, 인간이 인지한 대상과 세계는 ‘이해라는 땅 위에서 역동적으로 수립되는 인간 특유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에는 예외 없이 ‘이해’가 스며 있다. ‘이해’가 인지의 내용과 특징을 결정한다. 기억이나 감정과 같은 내면의 대상이든, 타인이나 물건과 같은 외면의 대상이든, 그에 대한 인간의 지각과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마지막 조건은 ‘이해’다. 니까야가 전하는 붓다의 수행 과정에서도, 붓다는 해탈의 경험을 ‘해탈했다는 이해[解脫知]’로 확인하고 있다.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다. 이해가 인간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
중생 인간의 이해는 ‘동일성 관념’에 물들어 있다
언어에 부가된 ‘동일·독자·불변의 단수적 존재’라는 ‘허구’. 그리고 언어에 담겨 있는 ‘섞임·관계·변화의 복수적 사태’라는 ‘사실 그대로’.-언어에는 이 양면적 사태가 얽혀 있다. 중생 인간은 언어의 양면적 사태 가운데 허구적 요청을 선택했다. 그 후 중생 언어 인간의 관점과 이해를 수립하는 토대는 ‘동일성 관념’이 되었다.
‘동일성 관념’이란 ‘언어·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일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관점 및 이해’를 지칭하며, ‘동일성·독자성·불변성을 지닌 단수적 존재’라는 언어적 허구를 압축시킨 용어다. 〈변치 않는다〉라는 불변성 관념과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독자성 관념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내용을 간직한다〉라는 ‘동일성 관념’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언어 인간에게 내면화된 동일성 관념’은 모든 유형의 관점과 이해를 수립하는 압도적 기반이다.
〈무명無明·‘무명에 매인 의도 작용[行]’·알음알이[識]의 상호 조건적 발생과 소멸〉을 설하는 12연기는, 해탈·열반의 문을 여는 근본 열쇠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열쇠에 접근하는 유력한 단서는 〈‘동일성 관념’은 중생 언어 인간이 수립하는 관점·이해의 토대다〉라는 것이다. 알음알이 작용의 내용은 의도 작용에 따라 달라지고, 의도 작용은 의존하는 관점·이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무명과 함께하는 의도 작용과 알음알이’를 ‘지혜와 함께 하는 의도 작용과 알음알이’로 바꾸려면, ‘의도 작용이 의존하는 관점과 이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중생 언어인간의 관점과 이해를 수립하는 토대는 ‘동일성 관념’이다. 따라서 ‘동일성 관념’에서 벗어나야 ‘지혜와 함께하는 의도 작용’이 생겨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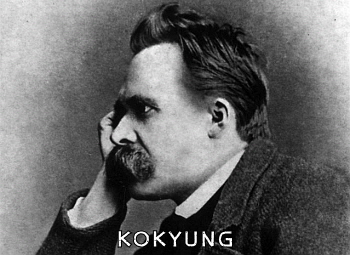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는 고통을 문제 삼는 불교의 태도를 일종의 ‘병적 감수성(Decadence)’의 표현으로 본다. 불교뿐 아니라 서양 기독교 전통을 포함한 모든 종교는, 세속적 욕망의 건강성을 상실 및 훼손하는 고통의 데카당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비록 불교가 기독교 전통보다는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고통의 문제를 다루지만, 욕망의 야성적 건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 ‘병적 감수성’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불교가 대두할 당시의 인도 지식층들은 전반적으로 고통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문명이 고도 성숙기에 들어 개념적 작업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야성적이고 건강한 본능과 욕망을 상실하고 작은 고통에도 지나치게 민감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신적 피로와 새로운 가치의 공백으로 인한 허무감에 빠져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적당한 안락을 추구하는 인간을, 니체는 말세인이라 불렀다. 불교는 비록 기독교보다 훨씬 건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삶을 고양하려는 사상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과도한 감수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말세인의 삶처럼 일종의 수동적 허무주의(Nihilism)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불교를 보는 니체의 시선이다.
붓다가 괴로움의 문제를 주목한 이유에 대한 니체의 분석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붓다가 ‘삶의 괴로움’을 강조한 것은, 병적 감수성의 표현이 아니라 언어 인간의 심층과 현실에 대한 통찰 때문이다. 붓다가 주목한 ‘인간 특유의 보편적 고통 상황[苦]’은, ‘동일·독자·불변이라는 언어적 허구’와 ‘섞임·관계·변화라는 사실 그대로’가 지속적으로 불화하고 충돌하는 사태다. 이 충돌을 삶의 모든 국면에서 겪고 있는 것이 인간의 고통이다. 붓다의 통찰에 따르면, ‘동일성 관념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욕망’은 충족시킬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고 해로운 욕망’이다. 반면에 ‘동일성 관념의 굴레를 벗은 욕구’는 인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한다. ‘건강하고 이로운 욕구’다.
‘건강하지 않고 해로운 욕망’에 짓눌린 노예의 삶을 청산케 하는 길에 눈 돌리게 하는 것.-‘삶의 괴로움에 관한 진리[苦諦]’를 통한 붓다의 안내다. 괴로움에 매인 삶의 발생과 괴로움 해소의 조건들 및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진리[集諦]’의 안내다. 그리고 ‘건강하고 이로운 욕구’를 생생하게 펼치는 ‘주인 된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滅諦]’의 안내이고, ‘주인 된 삶’을 성취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道諦]’의 안내다. 돈오견성의 길에서는 이 안내가 개성 있는 언어에 담겨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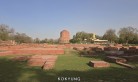
이해와 마음 그리고 돈오 -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
팔정도 해탈 수행은 그 내용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팔정도 수행 항목의 배열 순서에 따르면, ‘이해를 통한 향상 수행(혜학慧學: 정견正見·정사正思)’, ‘행위 단속을 통한 향상 수행(계…
박태원 /
-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연등국제선원 반야당 개축
연합방생대법회 및 산불피해 성금 전달영남과 산청 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철스님문도회가 자비의 마음을 보탰습니다. 성철스님문도회는 지난 4월 3일 겁외사 인근 성철공원에서 전국방생대법회…
편집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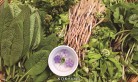
홍성 상륜암 선준스님의 사찰음식
충남 홍성의 거북이 마을에는 보개산이 마을을 수호합니다. 보개산 숲속에는 12개의 바위가 있고 하나하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자락의 끝에는 작은 암자 상륜암이 자리하고 있습니…
박성희 /
-

하늘과 땅을 품고 덮다[函蓋乾坤]
중국선 이야기 50_ 운문종 ❺ 문언文偃이 창립한 운문종의 사상적 특질은 ‘운문삼구雲門三句’에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에서는 “소양韶陽(…
김진무 /
-

참나_무아
55*46cm, 거울에 아크릴, 진철문.
고경 필자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