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
연산군 시기 불교정책의 변화
페이지 정보
이종수 / 2025 년 5 월 [통권 제145호] / / 작성일25-05-04 21:58 / 조회12회 / 댓글0건본문
조선시대에 임금이 되었지만 ‘왕王’의 호칭을 받지 못하고 ‘군君’이라 불린 임금이 두 명 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연산군은 1506년의 ‘반정反正’으로 쫓겨난 후 강화의 교동도로 유배되었다가 병사하였고, 광해군은 1623년의 반정으로 쫓겨난 후, 강화도–교동도-제주도 등에서 19년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이 가운데 연산군의 불교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비교적 불교정책에 관대했던 초반기
연산군은 재위 12년(1494~1506)의 초반에는 불교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며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대신들의 거듭되는 불교 배척의 요구에 대해서도 홍문관에 명하여 “역대의 임금 중에는 불도를 숭상하였으되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길지 않은 이도 있고, 불도를 숭상하지 않았는데도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린 이도 있으니 … 이런 임금들의 일을 기록하여 보고하라.”(『연산군일기』 2년(1496) 윤 3월 30일)고 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금후로 왕패王牌가 있는 사찰에는 일체 잡역을 면제하라. 이것은 세 대비의 명이니 어길 수 없다.”(『연산군일기』 2년(1496) 10월 15일)고 하여, 왕실 원당으로 지정된 사찰만큼은 대비의 명을 핑계로 그 경제적 특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1497년(연산군 3) 능침 사찰인 견성사見性寺의 중창 불사에 대해 대신들이 여러 차례 간언하며 반대하였으나 연산군은 끝까지 불교를 옹호하며 공사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답을 둘러싼 오대산 상원사와 백성 사이의 갈등에서도 상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왕은 명하여 선산蒜山의 민전을 상원사에 도로 주게 하니, 장령 이세인이 아뢰기를, “세조 때에 선산의 제언堤堰 안에 있는 묵정밭을 상원사에 내려주었사온데, 그 후에 상원사 승려가 그 곁에 있는 민전을 침식하였으므로, 성종 때에 침탈한 죄를 다스리고 그 밭을 백성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원사 승려들이 또 그 밭을 빼앗았으니 횡포가 막심하온즉,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제방 안의 땅이 만약 실지로 민전이었다면, 승려들이 어찌 능히 빼앗을 수 있으며 비록 빼앗고자 할지라도 어찌 나에게 고하는 자가 없겠느냐. 이는 실로 선대 왕조에서 그 절의 승려에게 지급한 것이었는데, 지금 상고할 만한 호적이 없으므로 간사한 백성이 얽어매서 나를 속이려는 것이다.”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 4년(1498) 11월 21일.

연산군이 상원사의 전답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기보다 불심이 깊었던 대비들의 요청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불교 옹호적 입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 정책은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1502년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홍문관 응교 김감 등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여러 사람의 간언을 거절하고 도리어 불경을 인쇄하는 일로써 복리를 구하려 하십니까. 기록하는 자들이 훗날 사서史書에 써서, 전하를 인경시주印經施主의 웃음거리로 만대에 남길 것이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빨리 멈추소서.”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아니하였다.
- 『연산군일기』 7년(1501) 2월 3일.
대사헌 김영정, 대사간 안윤손 등이 아뢰기를, “정현조가 불교를 숭상한 일과 정미수가 법을 범한 일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 『연산군일기』 8년 임술(1502) 7월 10일.
연산군의 불교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1503년(연산군 9)이었다. 이 무렵 선비들과 승려의 교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요즈음 간쟁하는 이들이 모두 이단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과 사실이 어긋나서 왕왕 승려들이 경대부 집에 출입하고 또 선비들과 교분을 맺으니, 이것은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다. 만약 금범을 범한 자가 있으면 조정 관리는 파면시키고, 재상이나 선비들도 또한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 또 승려들을 도성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야 하고, 사헌부에서 만약 엄격히 금지하지 못하면 아울러 죄를 다스려라.”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 9년 계해(1503) 1월 18일.
연산군은 ‘대신들이 겉으로는 불교를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승려들과 교류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였다. 하지만 1504년 3월까지는 불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가령 “절을 중수하는 것과 어버이를 위하여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고, 또 “사람들이 그 누가 나의 뜻을 모르랴? 이단이 세상에 유익한 것이 아니지만 부득이 병중에 계시는 대비의 뜻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다.”(『연산군일기』 10년(1504) 1월 8일)라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사화가 본격화되는 1504년 윤 4월부터 연산군의 불교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다.
갑자사화 이후 본격화된 배불정책
전교하기를, “왕자·부마駙馬 등을 불러 ‘너희들의 어미가 비복婢僕으로 머리 깎고 승려가 되려 하는데, 너희들이 따르면 중한 죄로 논할 것이다.’라고 말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세조 이상 후궁으로, 전에 승려가 된 자는 머리를 기르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비侍婢로서 여종이 된 자는 속히 머리를 기르게 하라.”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 10년(1504) 윤 4월 19일.

연산군은 선왕의 후궁으로서 이미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된 경우는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출가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세조 대 이전의 후궁으로서 살아 있는 비구니들은 한곳에 모여 살게 하고, 자수궁·수성궁·창수궁 등에 있는 비구니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갑자년의 사화가 발생하기 전과는 다른 정책들이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불교 탄압 정책을 발표하였다.
전교하기를, “승려들을 시켜 장의사의 불상을 8월 15일 전에 모조리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정업원과 안암사의 비구니들은 모두 한치형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하며, 내불당內佛堂은 흥천사로 옮기고, 향림사의 불상은 회암사로 옮겨라.”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 10년(1504) 7월 29일.
오늘날 서울 세검정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던 장의사는 왕실의 각종 천도의례를 설행하던 대표적 사찰이었으며, 세종대에는 교종 18사寺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국가에서 위상이 높은 사찰이었다. 그런데 그 불상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장의사를 폐사하고 그곳에 화단을 쌓아 각종 화초를 심고, 이궁離宮을 짓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1506) 2월 30일) 게다가 궁궐 내에 있던 정업원과 내불당을 폐지하여 왕실 여성들의 신앙적 구심점을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전교하기를, “비구니 2인을 이미 궁궐 문밖에 잡아 왔으니 당직청에서 고문하라. 이 비구니들은 일찍이 성종 후궁의 머리를 깎았었다. 선왕의 후궁은 마땅히 몸을 지켜야 할 뿐인데, 어찌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사도邪道를 따라야 하겠는가. 나의 생각에 정업원은 또한 없어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미 도성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이 여승은 비록 홀로 한 일이라 하나 반드시 무리들이 있을 것이며, 또 삭발할 때 출가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였을 것이 분명하니, 고문하라.”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 10년(1504) 11월 13일.

연산군은 궁궐 내의 불당을 모두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후궁을 삭발시킨 비구니를 잡아와 고문하게 하였다. 궁궐 사람으로서 출가를 하거나 출가를 권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차산의 활쏘기장 근처에 있는 미륵 석상을 땅에 묻어버렸고(『연산군일기』 10년(1504) 10월 25일) 도성 내의 원각사를 폐사시켰다.
전교하기를, “… 원각사가 도성 한 가운데에 있는데 비록 세조께서 창건하신 사찰이라 하더라도 역시 한때의 일이요 만세의 법은 아니며, 또 나라의 복을 연장시키는 곳도 아니니, 마땅히 그 승려들을 축출하고 절을 비워 두었다가 국가에 일이 있으면 쓰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연산군일기』 10년(1504) 12월 26일.
1504년 7월 10일 연산군은 성균관이 궁궐 담장에 가까워 국가의 체모가 편하지 못하고 원각사는 바른 도道가 아니므로 폐사하여 그 자리에 성균관을 옮기라고 명하였다가, 왕실의 반대로 이튿날 취소했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원각사 승려들을 모두 쫓아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후에 음악을 관장하는 장악원掌樂院을 원각사에 옮기도록 하여 사실상 폐사를 명하였다.(『연산군일기』 11년(1505) 2월 21일) 또한 왕실에서 거행되던 각종 불교음악도 폐지를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모든 가곡 중에서 세계중생백화분기악世界衆生百花紛其萼이라든가 회무回舞할 때에 부르는 서방대교주 및 그 나머지 부처와 관계되는 말은 모두 다 쓰지 말고, 지난날 가사를 작사한 문신으로 하여금 가사를 고쳐 국가의 덕을 기술하도록 하여 회무할 때에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 11년(1505) 5월 7일.
왕실에서 행사를 거행할 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곡이 연주되었다. 그 음악의 가사에서 불교적인 가사를 모두 고치도록 명한 것이다. 그만큼 연산군은 불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태도는 갈수록 심화되어 1506년부터 불교 탄압이 더욱 강화된다.
전교하기를, “봉선사에 봉안되어 있는 선대 임금의 영정을 택일하여 이안하라. 승려들은 모두 찾아내어 문서를 작성하여 머물러 둘 만한 자는 장가들게 하여 금표 내의 밭을 갈아먹게 하고 사냥할 때에 역사를 시키게 하라. … 정업원 여승도 둘 만한 자는 두고 그 나머지와 각처의 여승은 모두 연방원의 종으로 삼아라.”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 12년(1506) 3월 23일.
전교하기를, “수색해서 찾아낸 승려들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켜 궁안의 사냥 몰이꾼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 『연산군일기』 12년(1506) 7월 1일.
임금이 장령 김지와 함께 조준방調隼坊의 군인을 거느리고 서쪽 금표 안에 있는 정토사에서 사냥을 하였다.
- 『연산군일기』 12년(1506) 7월 25일.

무오년인 1498년 7월 훈구파 대신의 모함으로 시작된 ‘사화士禍’로 인해 많은 사림파 대신들이 희생을 당하였지만 불교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사화가 본격화되는 1504년 윤 4월부터 불교에 대한 탄압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였다.
연산군은 자신의 친어머니, 즉 폐비 윤씨의 죽음 과정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한 대비가 신앙하는 불교에 대해서도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1506년 9월 28일 반정으로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이복동생인 ‘역懌’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된다. 중종은 왕위에 오른 후 연산군이 파괴한 사찰 등을 복구하지 않았다. 이후 승려들은 명종대 문정왕후의 불교중흥 시기를 제외하면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출가자로서 인정을 받기보다 속세의 양민과 다름없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하늘과 땅을 품고 덮다[函蓋乾坤]
중국선 이야기 50_ 운문종 ❺ 문언文偃이 창립한 운문종의 사상적 특질은 ‘운문삼구雲門三句’에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에서는 “소양韶陽(…
김진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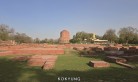
이해와 마음 그리고 돈오 - 인간은 이해하는 존재
팔정도 해탈 수행은 그 내용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팔정도 수행 항목의 배열 순서에 따르면, ‘이해를 통한 향상 수행(혜학慧學: 정견正見·정사正思)’, ‘행위 단속을 통한 향상 수행(계…
박태원 /
-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연등국제선원 반야당 개축
연합방생대법회 및 산불피해 성금 전달영남과 산청 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철스님문도회가 자비의 마음을 보탰습니다. 성철스님문도회는 지난 4월 3일 겁외사 인근 성철공원에서 전국방생대법회…
편집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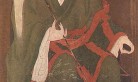
정각지겸의 『종문원상집』
12〜13세기 중원은 금나라에 의하여 북송이 멸망하고, 이어 몽고에 의하여 남송마저 멸망하게 된다. 이 시기 고려는 문벌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무신들이 집권하게 된다. 한마디로 전란의 시기였다. “성…
김방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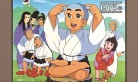
반골의 선승 잇큐 소준
일본선 이야기 17 1975년부터 1982년까지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잇큐상(一休さん)>이라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296회에 걸쳐 방영되었다. 선찰인 …
원영상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