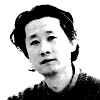[현대문학 속의 불교 ]
선시의 ‘수사법’이 만든 ‘침묵’의 표상
페이지 정보
김춘식 / 2025 년 8 월 [통권 제148호] / / 작성일25-08-05 13:14 / 조회322회 / 댓글0건본문
미당 서정주는 불교적 은유로서 ‘인연’과 ‘설화’, 그리고 ‘노래’라는 개념을 한국 현대시에 정착시켰는데, 그 원천은 『삼국유사』와 향가를 경유하여 신라라는 ‘고대성’을 상상으로 복원하는 시창작 과정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불교적 사유나 인식이 현대문학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는 ‘불교’가 문화의 차원에서 존재할 때는 마치 일상적 삶의 일부로서 잘 의식되지 않는 것처럼 보통의 경우는 ‘늘 그래왔던 것’으로 간과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야기나 설화적 상상이 시 속에 틈입되는 과정, 그리고 시가 지닌 미적 형식 중 전통적인 시가와 노래의 양식, 정조가 현대시에 안착되는 일은 ‘저절로’이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근대성’을 역사적 진보로 확신해 온 ‘아시아적 근대화’의 패러다임 속에서 ‘아시아적 가치’는 언제나 주변부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불교’가 ‘현대문학’의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통적인 것의 현대화’라는 문제의식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것이기도 하다. 정신사적으로 말하면 ‘근대성’을 타자의 것이 아닌 ‘자신의 내부적 변혁이나 유신’에서 획득하려는 ‘주체적 고투’의 과정은 ‘전통/근대’의 동시적 성취가 목적이었고, 이 점이 불교의 ‘화쟁’이나 ‘원융’과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 연재에서 말한 것처럼, 석전과 경허, 만공의 선시적 수사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의 ‘침묵’의 표상(주1)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이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불교적인 수사 안에서 하나의 ‘표상성’을 갖는 것처럼, 시조나 한시의 문화적 전통 안에는 유가적인 것 외에 ‘불교적 수사’ 또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중 선시에 자주 나오는 ‘산수’와 ‘자연’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불교적인 유심론’에 기반하는 ‘심물心物의 경계 없음’을 나타내는 표상에 해당된다.
최남선의 ‘국토의 발견’과 ‘시조 부흥론’, ‘전통의 현대화’라는 문학적 근대화의 기획안에서 석전 박한영과 선승들의 ‘자연, 화엄정토’의 영향을 읽어낼 수 있는 이유는,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본처’를 구하는 ‘선禪’의 오랜 전통이 만든 ‘자연의 표상’을 ‘조선심’, ‘조선의 얼’, ‘조선의 맥박’ 등의 수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25년 전후의 시점에서 보면 『님의 침묵』은 ‘근대’라는 혼돈과 가능성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나타난 시집으로서 ‘자유시’ 속에 비로소 ‘전통적 사유와 문화’를 담아낸 성취를 이루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화쟁을 통한 원융’에 해당되며, 이것은 한용운이 말한 ‘유신’의 구체적 실천에 해당된다.
한용운의 ‘오도송’과 소리의 의미
男兒到處是故鄕 남아가 가는 곳 그 어디나 고향이건만
幾人長在客愁中 나그네 시름에 겨운 사람 그 몇이던가
一聲喝破三千界 한 소리가 우주를 깨우쳐 밝히니
雪裏桃花片片紅 눈 속에 복사꽃이 펄펄 날리네
- 한용운, 「오도송悟道頌」
1917년 오세암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일화와 함께 전해지는 것이 이 작품이다. ‘설리도화雪裏桃花’라는 표현은 ‘만공 선사’의 시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진여문眞如門’의 경지에서 본 ‘경계 없음’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만공의 ‘설리도화겁외춘雪裏桃花劫外春’이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시간’의 경계조차 없음을 나타내듯이, 만해의 오도송은 ‘한 소리가 삼천계’를 가로질러 감으로써 경계가 없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경계 없음’의 깨우침이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인 체험’이라는 점에서 ‘설리도화雪裏桃花’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교외별전敎外別傳’, ‘염화미소拈華微笑’, ‘격외선格外禪’ 등 체험을 전제로 한 ‘불립문자’에 해당된다.

‘불립문자’이면서 ‘불리문자’인 것이 깨달음의 언어이듯이, 시적 언어 역시 종종 ‘불립문자/불리문자’에 비유되고는 한다. 그런데, 이런 시적 언어와 선시의 대비 자체가 ‘불교’와 시의 만남을 전제로 한 사유라는 점에서 ‘한국 현대시’는 이미 오래전에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사유를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언제부터 ‘현대시’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 1930년대 이후 한국 현대시의 중심에서 활동한 신석정, 김달진, 함형수, 서정주, 조지훈 등의 시인(중앙학림과 혜화전문 출신), 그리고 1910년대부터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정인보, 최남선, 이광수, 이병기, 이은상 등 ‘한학’적 교양을 지닌 많은 시인들의 ‘시적 사유’ 안에서 ‘시와 선’의 만남은 이미 전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 이유는 ‘석전’, ‘경허’, ‘만공’ 등의 시와 글을 그들이 읽었고, 문집의 형태로 일찍이 책이 간행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리’는 이 점에서 ‘문자’가 그렇듯이, ‘소리’이면서 ‘소리’가 아닌 것이 되어야 비로소 ‘삼천계’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된다. ‘분별이 없음’,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경계 없음’ 속에서 ‘소리는 곧 침묵이요, 침묵이 곧 소리인 것이다’. 한용운의 ‘침묵’은 이 점에서 한 ‘소리’의 ‘경계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 얻어진 것으로 「님의 침묵」은 달리 말하면 ‘님의 말씀’, ‘님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이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골에 눈멀었습니다”(「님의 침묵」)는 역설적으로 모든 감각이 끊어진 경지로 ‘귀먹고 눈멀어’ ‘침묵’의 의미를 아는 상태이다. ‘침묵’을 체득하였기에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석전, 경허, 만공의 선과 자연의 침묵
석전 박한영과 만공은 두 사람 모두 만해 한용운에게 많은 영향을 준 승려이다. 이능화가 “30본산 전후 주지 50여 인 가운데 선종에 속하는 자는 불과 3, 4인”(주2)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1910년대 당시 불교계의 선풍이 쇠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전 박한영과 경허의 선풍을 이은 만공, 혜월, 한암 그리고 임제종 창립을 이끈 오성월 등이 한용운과 밀접한 인연을 맺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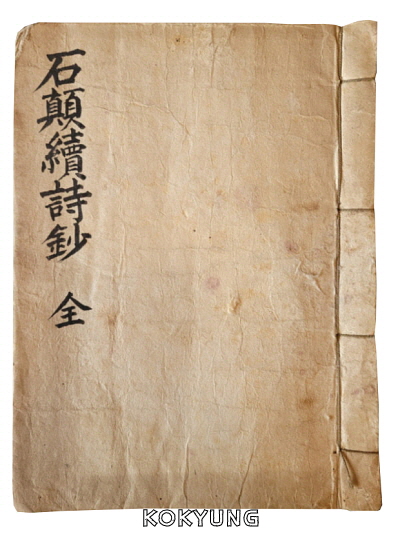
다만,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백파긍선의 교와 계율을 중시하는 선풍을 계승한 석전 박한영과 격외선을 강조하는 경허, 만공의 선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용운은 석전 박한영에게서 근대적인 지식과 학문, 유신維新을 위한 방편과 실천을 얻었다면, 경허와 만공에게서는 ‘선적 지혜’를 통한 믿음의 원천을 확인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非仙非佛又非天 신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또한 하늘도 아니구나
嵓嵓皚皚啣紫烟 희고 흰 바위산에 보랏빛 아지랑이
誰道登斯閑閣筆 누구라도 오르다 보면 예서 붓도 멎으리
通身莞爾入詩禪 온몸이 트여 웃으며 시와 선에 들다
- 석전 박한영, 「헐성루歇惺樓」(주3)
인용한 석전 박한영의 한시를 보면 ‘입시선入詩禪’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초에 시와 선의 ‘경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붓이 멈춘다’라는 말은 ‘시와 선’의 공통된 지점에 있는 ‘침묵’을 의미한다. ‘시와 선’의 경지란 이 점에서 ‘침묵’, ‘공空’과 일치하는 것으로, 신선도, 부처도, 하늘도 구분이 없이 ‘여여如如’한 상태, 곧 말이 필요하지 않은 불립문자의 상태를 의미한다.
本太平天眞佛 본성이 태평천진한 부처가
月明中樹上啼 밝은 달빛 속 나무 위에서 우네
山中夜深人寂 산은 공허하고 밤은 깊어 인적은 고요한데
唯有爾聲東西 오직 네 소리만 동서로 들리는구나
- 경허, 「정혜사 두견새(定慧寺杜鵑)」(주4)
선시의 주요 소재가 자연물인 것은 ‘선승’의 주요 거처가 ‘산’이었다는 사실에도 원인이 있지만, 인식적인 차원에 보면 근본적으로는 선의 핵심이 ‘물과 심’의 관계에서 그 ‘경계 없음’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리’가 감각 기관을 통한 인식에 다다르는 과정은 ‘12처 6식’을 따르지만, 이런 감각적 인식은 그 감각과 인식의 개체성을 넘어서면 ‘색과 공’의 구분이 없는 ‘경계 없음’에 닿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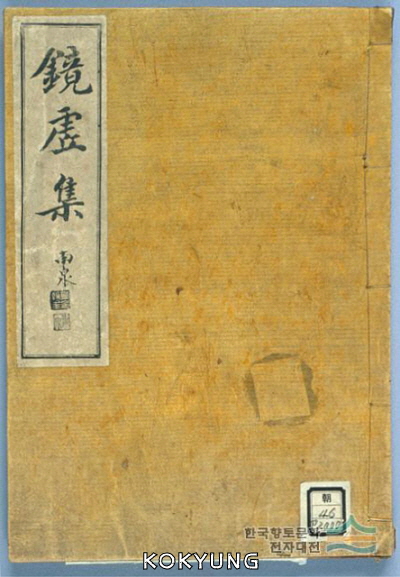
‘유심唯心’의 ‘마음’은 이 점에서 개체의 마음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없어진 상태의 ‘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물아일체의 상태이며 ‘불성, 불심’을 의미한다. “본성이 태평천진한 부처”는 ‘만유’에 깃들어 있는 것으로 ‘두견새’의 울음소리는 특정한 순간의 소리이면서 동시에 ‘소리’의 경계를 초월한 일종의 만유’와의 ‘접촉’이나 ‘섞임’의 체험을 제공한다. ‘소리’가 깨달음의 ‘순간’을 만들듯이, ‘자연’은 감각적 대상으로서 그 감각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된다. ‘침묵’의 언어란, 언어의 ‘도구성’을 넘어선 언어로서 개개의 현상을 초월한 ‘심’ 혹은 ‘진여’의 상태에 닿은 언어이다. 선시의 수사법이 만드는 ‘언어’는 이 점에서 종종 침묵의 언어에 비유되는 것이다.
上堂云 三世唯心 唯心三世 一切法空觀自在 處處光明處處身 這箇泡幻同無碍 吐雲如山 呑川如海 了無毛髮居其外 森羅萬像盡我家 只個虛空肚皮大.
법좌에 올라 말씀하셨다. 삼세가 오직 마음이요. 오직 이 마음이 삼세로다. 일제 모든 법이 공한 것을 보는 자재이니 곳곳마다 광명이요 곳곳마다 법신이라, 이는 거품과 환영처럼 걸림이 없도다. 구름을 토함은 저 산과 같고 냇물을 삼킴은 저 바다와 같도다. 마침내 모발이 없는 그 밖에 거처하니 삼라만상이 다 나의 집이로다. 다만 이 허공의 뱃가죽이 크기도 하도다.
- 만공, 「오직 마음(唯心)」(주5)
인용한 내용은 만공의 법어인데, ‘유심’이 ‘관자재觀自在’와 ‘법신法身’임을 말하고 있다. 불교적인 의미에서 법신은 곳 부처이고 개체아의 몸을 떠난 ‘참된 자아’를 뜻한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부처가 곧 유심’이라는 뜻으로 이 단계에서 ‘님’과 ‘나’의 구별은 무의미하게 된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은 ‘대상’이지만 ‘침묵’의 차원에서 말하면 ‘나’와 ‘님’의 구분은 없는 것이다. 『님의 침묵』에서 나오는 ‘사랑’과 ‘연애’의 수사는 지극히 ‘감각적’이지만 그 감각은 ‘소리’가 감각을 초월하여 ‘침묵’에 이르듯이, ‘사랑’의 감각을 넘어서 ‘침묵’의 단계에 이르면 ‘님’과 ‘나’의 마음이 ‘경계’를 잃고 하나가 된다. ‘님’과 ‘나’의 이별은 이미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만남은 ‘사랑’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구도’와 ‘깨달음’의 경지, 즉 ‘관자재’한 ‘유심’의 단계를 암시한다. ‘사랑’과 ‘부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말은, 다소 관념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님의 침묵』을, 사랑과 이별의 서사 양식을 빌려서 깨달음을 향한 구도 여정을 암시하는 뛰어난 작품으로 읽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霜天月落夜將半 서리찬 하늘 달마저 진 깊은 밤에
誰共澄潭照影寒 맑은 물에 차갑게 비추는 그림자를 누구와 함께 할까
露鳥不萌枝上夢 백로는 앙상한 가지 위에서 꿈꾸고
覺華無形樹頭春 각화는 형상 없는 나무 끝의 봄이로세
- 만공, 「각화覺華」(주6)
‘침묵’하는 자연의 상태는 사실 ‘분별’이 있는 ‘색’의 세계에서 보면 언제나 ‘상실’과 ‘결핍’의 상태에 해당한다. 선시의 수사에는 이 점에서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하는데, 참된 의미를 상실한 상태로서의 ‘만유(자연)’와 그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만유’이다. ‘마음’이 거처하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만유’는 ‘곳곳에 법신’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의미가 상실된 ‘결핍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색의 경계를 넘어선 ‘침묵’과 단절을 암시하는 ‘침묵’은 이 점에서 늘 공존하는 것이다.

“露鳥不萌枝上夢 覺華無形樹頭春(백로는 앙상한 가지 위에서 꿈꾸고 각화는 형상 없는 나무 끝의 봄이로세)”에서 ‘백로와 각화’, ‘앙상한 가지 위에서 꾸는 꿈과 형상 없는 나무 끝의 봄’은 서로 대비되는 것으로, 전자는 ‘색色’의 상황을, 후자는 경계를 넘은 유심의 단계를 각각 나타낸다.
이처럼 석전 박한영의 ‘시선일여’나, 경허의 ‘두견새 울음소리’의 개체 감각을 초월한 접촉, 만공의 선시와 법어에 담긴 ‘유심’과 ‘경계 없음’은 모두 『님의 침묵』에 담긴 불교적 수사와 깊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표기문자와 시의 형식을 넘어서 ‘선’이라는 공통된 사유와 인식의 체계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점은 한용운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의 형성에 불교적 인식과 문화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분명한 예시이다.
<각주>
(주1) 문학용어로서 표상은 ‘representation’의 번역으로서 ‘재현’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재현이 리얼리즘적인 차원에서 ‘원본과 복사본의 동일성/유사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표상은 ‘재현 불가능성’ 즉 원본과 복사본의 관계를 전혀 별개의 새로운 창안물 혹은 ‘기표’로 간주하는 후기구조주의적인 특징을 반영한 번역어이다.
(주2)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하, 신문관, 1918. 962쪽.
(주3) 고재석, 『한국근대문학지성사』, 깊은샘, 1991. 144쪽.
(주4)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 『경허록』, 불광출판사, 2025. 162쪽.
(주5)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 『만공법어』, 불광출판사, 2025. 47쪽.
(주6) 경허록·만공법어편찬위원회, 『만공법어』, 불광출판사, 2025. 218쪽.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네팔 유일의 자따까 성지 나모붓다 사리탑
카트만두에서 남동쪽으로 52km 떨어진 바그마띠(Bagmati)주의 까브레빠란 삼거리(Kavrepalan-Chowk)에 위치한 ‘나모붓다탑(Namo Buddha Stupa)’은 붓다의 진신사리를 모…
김규현 /
-

햇살 속에서 익어가는 시간, 발효의 기적
8월은 발효의 계절입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발효는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발효가 되어 가는 향기를 맡으며 발효를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음식을 경험…
박성희 /
-

초의선사의 다법과 육우의 병차 만들기
거연심우소요 58_ 대흥사 ❻ 초의선사의 다법을 보면, 찻잎을 따서 뜨거운 솥에 덖어서 밀실에서 건조시킨 다음, 이를 잣나무로 만든 틀에 넣어 일정한 형태로 찍어내고 대나무 껍질…
정종섭 /
-

운문종의 법계와 설숭의 유불융합
중국선 이야기 53_ 운문종 ❽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당조唐朝가 멸망하고, 중국은 북방의 오대五代와 남방의 십국十國으로 분열되었다. 이 시기에 북방의…
김진무 /
-

인도 동북부 수해 지역 찾아 구호물품과 보시금 전달
연등글로벌네트워크 회원들은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州 마이뜨리뿌리 지역의 사찰과 마을을 찾아 수해복구를 위한 보시금과 구호물품 등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6월 초…
편집부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