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다 원효 혜능 성철에게 묻고 듣다 ]
‘마음 돈오’를 열어주는 두 문① - 직지인심 대화문
페이지 정보
박태원 / 2025 년 11 월 [통권 제151호] / / 작성일25-11-05 09:31 / 조회16회 / 댓글0건본문
선종의 선문禪門이 천명하는 돈오견성은 ‘이해 돈오’가 아니라 ‘이해를 굴리는 마음 돈오’다. 그리고 마음 돈오는 단지 관점이나 사상의 이론적 천명이 아니라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마음 국면이며 검증의 대상이다. 무릇 모든 검증에는 방법과 검증 사례가 요청된다.
마음 돈오를 열어주는 선문禪門의 두 문
마음 돈오의 법문이 타당하다면, 그 진위를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로 검증된 사례들을 제시해야 한다.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체득 방법론이 없다면, 마음 돈오의 법문이 아무리 매혹적일지라도 검증 불가능한 주장이 되어 경험적으로는 무의미한 주장이 된다. 또 방법은 있어도 검증 사례가 없다면, 방법의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 붓다와 불교의 가르침이 지니는 특유의 생명력은, ‘검증하는 방법’과 ‘실제로 검증한 사례들’을 누적시켜 왔다는 점에 있다.
선종은 ‘마음 돈오의 경험 지평’을 열게 하는 어떤 방법을 설하고 있을까? 어떤 문을 통해 마음 돈오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을까? 혜능이 천명한 ‘무념無念의 돈오견성頓悟見性’이 후학들에 의해 계승되는 과정에서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 두 가지 문이 세워지고 있다.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 돈오에 눈 뜨게 하는 ‘직지인심直指人心 대화문’이 그 하나이고, 의심을 매개로 삼아 마음 돈오를 체득하게 하는 ‘간화선 화두 참구문’이 다른 하나이다.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과 임제의현臨濟義玄(?~867)은 혜능의 돈오견성법을 이은 적손嫡孫이다. 마조는 혜능-회양懷讓(677~744)을 이으면서 남종선을 이른바 조사선祖師禪으로 대성한 인물이다. 그리고 임제는 마조-백장百丈(749~814)-황벽黃檗(?~850)을 이으면서 조사선 개성의 정점을 보여준 인물이다.
조사선은 강서江西의 마조도일과 호남湖南의 석두희천石頭希遷(700~790) 및 그들의 문하에서 배출된 선사들의 활동으로 형성된 선종의 특징을 일컫는다. 학계에서는 조사선의 특징으로 흔히 ‘인간 본연에 대한 긍정적 표현’, ‘깨달음의 생활 세계적 구현’ 등을 꼽는다. 그리고 조사선의 이러한 특징은 ‘인도 선불교의 중국적 토착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화된 관점이다.
필자는 혜능이 무념無念·무상無相·무주無住 법문을 통해 천명한 선관禪觀의 요점을 만개시킨 양상이 조사선이며, 조사선이 드러낸 마음 돈오는 〈육근수호의 알아차림(sampajānāti)과 사마타 마음수행 → 유식사상의 유식무경唯識無境 → 공관을 품은 유식관에 의거한 원효의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一心]’〉을 통해 전승되어 온 마음수행의 본령을 잇는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본다. 조사선의 특징을 무엇이라 규정할지라도, 기존 불교와 전혀 다른 불교의 등장이 아니다. 조사선의 의의는, 선관의 불연속적 특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수행의 본령을 포착해 온 일련의 흐름을 계승하는 ‘연속성에서의 개성’에 있다고 본다.
조사선의 전개 과정에서는, 스승과 제자, 혹은 선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적인 대화법’이 형성되고 있다. 돈오견성 깨달음을 돈발頓發하게 하거나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이들의 대화법은, 일반적 대화법이나 기존 불교 전통의 대화법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마음 돈오를 체득하게 하는 ‘방법론적 대화법’이다. 이 방법론적 대화법에 의해 마음 돈오를 성취한 사례들이 속출한다. 그리하여 마음 돈오를 위한 방법과 실제 검증 사례들을 모두 갖추게 된다.
마조의 직지인심直指人心 대화문
마조 선사와 학인들의 대화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일대일 대면 대화에서 ‘무념의 마음 국면’을 ‘바로 그때 그 자리[卽今]’에서 일깨워 주는 독특한 화법이다. 예컨대 〈지금 나에게 묻는 자는 누구인가?〉,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식이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펼치고 있는 마음 작용을 바로 지적하여, ‘대상을 붙들고 나가는 마음’을 알아차려 문득 ‘붙들고 쫓아가는 국면’에서 빠져나와 ‘쫓아감과 매달림’을 그치게 한다. 〈알아차리면 곧 빠져나와 그친다〉라는 대목에 핵심이 있다.
강의 듣는 학생 하나가 생각에 빠져 있다. 〈수업 끝나면 무엇을 할까? 도서관? 축구? 인터넷 게임? 게임이 좋겠다. 새로 출시된 재미난 게임이 많던데, 어떤 걸 고르나?〉 -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선생은 학생의 표정을 보고, 그가 강의 현장을 떠나 ‘다른 생각들의 꼬리물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즉시 학생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른다. 선생이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학생은 ‘엉뚱한 생각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태’를 문득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그 순간, ‘생각 붙들고 따라가던 국면’에서 빠져나온다. 꼬리 물고 쫓아가던 마음 국면이 문득 그친다.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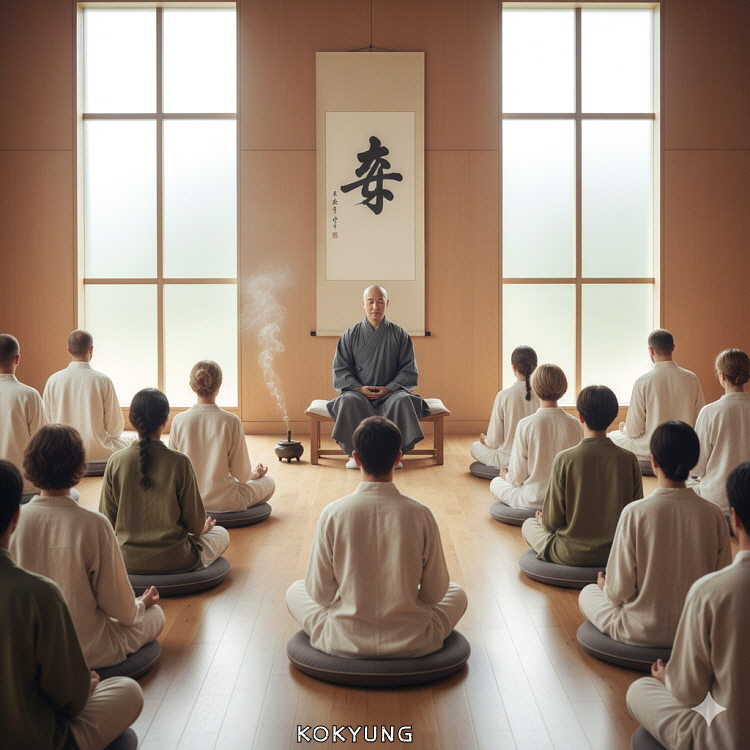
직지인심直指人心 대화법은 ‘붙들고 나가는 마음 행보를 그친 마음자리’, 그 무념의 마음 국면을, ‘바로 그때 그 자리[卽今]’에서 포착하게 한다. 이런 대화법에 사용되는 말은 소리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의 몸짓 언어도 거리낌 없이 동원하여 ‘무념의 마음 국면’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알게 한다. 〈한 입에 서강西江의 물을 다 마시면 알려주겠다〉라는 식의 비非일상적·비非논리적 언어를 동원하기도 한다. ‘대상을 붙들고 나가면서 분별하는 가공 작업’에서 작동하는 일상화된 논리와 언어방식을 차단하고 무념 국면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려는 언어 기법이다.
또 ‘원 모양[圓相]’과 같은 시각 언어를 사용하여 무념의 마음자리에 대한 서로의 안목[見處]을 확인하기도 한다. 대중 집회 상당上堂 법문은 혜능의 설법 방식과 같지만, 일대일 대면 상황에서는 일상 화법은 물론 몸짓 언어와 시각 언어까지 창발적으로 채택하여 ‘무념의 마음 국면’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일깨워 주는 대화법을 펼치고 있다.
〈무엇이 저 혜해慧海의 제 집안 보물 창고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지금 나에게 묻는 바로 그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갖추어 있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며 사용이 자유자재한데, 어찌 밖을 향하여 구하고 찾는가?〉 (혜해) 대주大珠가 말끝에 ‘[사실 그대로를 보는] 본연의 마음[本心]’은 [외부 대상을 쫓아가는] 지각知覺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여 감사를 표했다.(주1)
분주汾州의 무업無業 선사가 마조를 찾아뵈었다. 마조는 그의 풍채가 훌륭하고 말소리가 마치 종소리 같은 것을 보고는 말했다. 〈어마어마한 불당佛堂이지만 그 속에 부처가 없구나.〉 무업이 절을 하고 꿇어앉아 물었다. 〈삼승三乘의 학문은 대충이나마 그 뜻을 궁리해 보았습니다만, 늘 듣기로 선문禪門에서는 ‘바로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는데, 실로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다만 ‘아직 알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다른 물건은 없다.〉 무업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와서 비밀리에 전한 ‘마음의 증명[心印]’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스님은 지금 들떠 있으니 갔다가 다른 때 오시게.〉 무업이 막 나가려는데 마조가 불렀다. 〈스님!〉 무업이 머리를 돌리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무업이 바로 ‘알아차려 깨닫고는[領悟]’ 절을 하였다. 마조가 말했다. 〈이 둔한 사람아, 절은 무엇 하려고 하는가?〉(주2)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떻게 도에 합할 수 있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나는 일찍이 도에 합한 적이 없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곧 때리고는 말했다. 〈내가 만약 그대를 때리지 않는다면, 여러 곳에서 나를 비웃을 것이다.〉(주3)
어떤 강승講僧이 와서 물었다. 〈선종에서는 어떤 도리[法]를 전하고 지니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마조가 되물었다. 〈좌주座主께선 어떤 도리를 전하고 지닙니까?〉 〈감히 경론 이십여 권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사자 새끼가 아닌가?〉 … 마조가 말했다. 〈[사자가 굴에서] 나가지도 않고 [사자가 굴로]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좌주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하직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그때] 마조가 불렀다. 〈좌주!〉 좌주가 머리를 돌리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좌주가 역시 대답이 없자 마조가 말했다. 〈이 둔근기 스님아!〉(주4)
임제의 직지인심直指人心 대화문
임제 때에는 고함[喝]이나 몽둥이질[棒], 주먹질, 일상의 도구[拂子] 등을 사용하는 방식이 부각된다. 고함치는 소리 듣는 마음 국면, 몽둥이 맞아 아픈 줄 아는 마음 국면, 주먹질에 아픈 줄 아는 마음 국면, 먼지떨이채[拂子]를 보는 마음 국면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한다. 그리하여 ‘소리·아픔 등을 붙들고 분별의 가공 과정에 빠져드는 마음 국면’을 그치게 하고, ‘분별의 가공 과정에 빠져들지 않는 마음 국면’에 눈뜨게 하여 그 마음자리를 챙기게 한다. ‘생각하면서도 분별의 가공에 빠져들지 않는 마음 국면[無念]’에 눈떠 돈오 깨달음 영역에 자리 잡게 해준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선사께서는 누구의 가풍을 노래하며, 종풍은 누구를 이었습니까?〉 임제 선사가 말했다. 〈내가 황벽스님의 처소에서 세 차례 묻고 세 차례 얻어맞았다.〉 그 스님이 [뜻을] 헤아려 말하려 하자 임제 선사는 곧바로 고함[喝] 지르고, 뒤이어 [주장자를] 내리치면서 말했다. 〈허공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주5)
[임제 선사가] 법당에 오르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제 선사가 먼지떨이채[拂子]를 일으켜 세우니, 그 스님이 곧바로 고함[喝]을 질렀다. 임제 선사는 바로 [그 스님을] 때렸다.(주6)
사족: 선종 선문이 일깨워 주려는 무념無念은 ‘생각하면서도 분별의 가공에 빠져들지 않는 마음 국면’이다. 사유·판단·평가·감정·욕구의 전면적 중지나 삭제 상태가 아니다. 사실 그대로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사유·판단·평가·감정·욕구를, 사실 그대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굴리는 마음 국면이다. 붓다가 설하는 ‘알아차림(정념正念의 정지正知)’ 마음 수행도 그러하다고 본다. ‘알아차림’이나 ‘참선 수행’을 사유·판단·평가·감정·욕구의 중지나 삭제로 이해하는 관점이나 그런 시선에 의거한 ‘심리치료·명상 프로그램들’은 그 근거가 되는 선관禪觀을 재성찰하여 보완해야 한다. 모든 관점은 언제나 자신을 ‘재성찰하는 마음 거울’에 기꺼이 비추어야 한다. 그것이 붓다가 권면한 진리 탐구의 태도이고, 선의 공능이며, 선 수행자의 면모다.
<각주>
(주1) 『마조도일선사광록』(X1321, 3c08), “阿那箇是慧海自家寶藏? 祖曰. 即今問我者, 是汝寶藏. 一切具足, 更無欠少, 使用自在, 何假向外求覓? 珠於言下, 自識本心, 不由知覺, 踊躍禮謝.”
(주2) 『마조도일선사광록』(X1321, 4b02), “汾州無業禪師參祖. 祖覩其狀貌瓌偉, 語音如鐘, 乃曰. 巍巍佛堂, 其中無佛. 業, 禮跪而問曰. 三乘文學, 粗窮其旨, 常聞禪門即心是佛, 實未能了. 祖曰. 只未了底心即是. 更無別物. 業又問. 如何是祖師西來密傳心印? 祖曰. 大德正閙在, 且去, 別時來. 業纔出, 祖召曰. 大德! 業迴首, 祖云. 是什麼? 業便領悟, 禮拜. 祖云. 這鈍漢, 禮拜作麼?”
(주3) 『마조도일선사광록』(X1321, 4c24), “僧問. 如何得合道? 祖曰. 我早不合道. 問. 如何是西來意? 祖便打曰. 我若不打汝, 諸方笑我也.”
(주4) 『마조도일선사광록』(X1321, 5a11), “有講僧來問曰. 未審, 禪宗傳持何法? 祖却問曰. 座主傳持何法? 主曰. 忝講得經論二十餘本. 祖曰. 莫是獅子兒否? … 祖曰. 不出不入, 是甚麼法? 主無對. 遂辭出門. 祖召曰. 座主! 主回首, 祖曰. 是甚麼? 主亦無對, 祖曰. 這鈍根阿師!”
(주5) 『진주임제혜조선사어록』(T47, 496b18-23), “問. 師唱誰家曲, 宗風嗣阿誰? 師云. 我在黄蘗處, 三度發問, 三度被打. 僧擬議, 師便喝, 隨後打云. 不可向虚空裏釘橛去也.”
(주6) 『진주임제혜조선사어록』(T47, 496c23-26), “上堂, 僧問. 如何是佛法大意? 師竪起拂子, 僧便喝. 師便打.”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光陰莫虛度]
중국선 이야기 56_ 법안종 ❸ 법안종을 세운 문익은 청원계를 계승한 나한계침羅漢桂琛의 “만약 불법을 논한다면, 일체가 드러나 있는 것[一切現成]이다.”라는 말로부터…
김진무 /
-

불생선의 주창자 반케이 요타쿠
일본선 이야기 23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불교는 실질적인 경쟁자이자 동반자다. 유교는 불교로 인해 내면세계를 더욱 강화했고, 불교는 유교로 인해 현실 감각이 깊어진다.…
원영상 /
-

신라 말의 정치적 혼란과 선법의 전래
태안사 ❶ 태안사泰安寺는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에 있다. 죽곡면에서 태안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태안사 계곡으로 접어들어가면 동리산桐裏山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종섭 /
-

원력願力으로 만드는 세상
세계성취품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름밤, 하늘을 가득 채운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법한 질문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 그 질문 앞에 서 있…
보일스님 /
-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출간 외
서종택 시인의 책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봉정식 서종택 시인의 선禪 에세이집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출간 기념 봉정식이 지난 9월 20일 대구 정혜사 문수전에서 열…
편집부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