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연심우소요]
신라 말의 정치적 혼란과 선법의 전래
페이지 정보
정종섭 / 2025 년 11 월 [통권 제151호] / / 작성일25-11-05 09:37 / 조회19회 / 댓글0건본문
태안사 ❶
태안사泰安寺는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에 있다. 죽곡면에서 태안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태안사 계곡으로 접어들어가면 동리산桐裏山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태안사를 만난다. 구례에서 가도 멀지 않다. 지금이야 사계절 언제나 자동차로 편안하게 내왕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 옛날 걸어서 다니던 시절에는 이곳으로 오기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이곳은 옹달샘이 숨어 있는 깊고 깊은 산속이었다. 곡성은 원래 백제의 욕내군欲乃郡이었는데, 신라시대에 곡성으로 명명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나주羅州에 속했다가 조선시대에 곡성현으로 되어 현감縣監을 두었다.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산속의 어떤 은자隱者(hermit)가 세상의 밝은 이치를 일러준다고 하는데, 무명無明의 중생이 그 가르침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길이 먼 것이 대수이겠으며 산이 깊은 것이 장애障碍가 되겠는가. 산 넘고 물 건너서라도 찾아가지 않겠는가. 어둠에서 나와 진리의 밝은 빛을 보기만 하면 인간은 무장무애無障無礙하고 자유자재自由自在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리라.
송하문동자 松下問童子
언사채약거 言師採藥去
지재차산중 只在此山中
운심부지처 雲深不知處
소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만나 묻노라니,
스승님은 약초를 캐러 산에 가셨다 하는구나.
그래, 그분이 이 산중에 계신 것은 알겠는데,
구름이 깊고 자욱하니 그 계신 곳을 알 수가 없구나.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나의 눈을 뜨게 해줄 그 사람을 찾아 구름 가득한 유곡幽谷을 헤치고 다다른 산중의 그 자리는 바로 이와 같았다. 은자는 노장철학의 세계에서 형성된 개념이지만, 불가의 출가수행자도 은자이기는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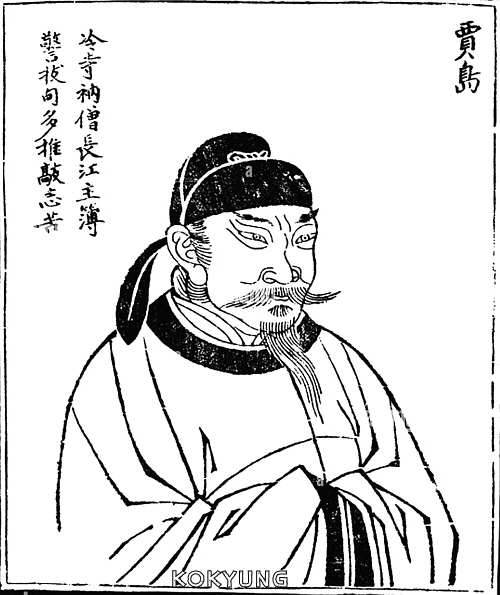
당나라 때 출가하였다가 속세로 돌아온 시인 가도賈島(779~843)가 지은 〈은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심은자불우尋隱者不遇)〉라는 시이다. 나에게 있어 평생 이 시만큼 자주 꺼내본 시도 없는 것 같다. 그 은자를 찾아보고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기도 했다. 때로는 멀리 보이는 것 같아 달려가기도 하고 갈수록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지쳐 주저앉기도 했다. 구름 깊은 곳에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헛것을 본 것 같아 정신을 추스르기도 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깊은 맛은 탐구와 사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리라. 궁극에 가서는 산에서 만난 동자童子는 강을 건너는 배일 수도 있고, 스승은 진리 그 자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출가했던 가도는 왜 환속還俗하여 과거시험에 매달렸을까? 선배인 왕유王維(699~759)와 같은 길을 가려고 했을까? 속俗이니 탈속脫俗이니 하는 것도 이미 초월한 상태에 도달한 것인가, 아니면 속세에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현실과 현상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규명하고 자유자재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 인간 세상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물어 볼 수 없으니 알 수 없다.

가도보다 앞서 살다 간 시인 맹호연孟浩然(689~740)의 절창絶唱도 생각난다. 고향인 양양襄陽 백마산白馬山 경공사景空寺의 융融선사를 방문하며 지은 <융화상의 난야에 가다(과융상인난야過融上人蘭若)>라는 시이다. 후세에 문인과 묵객들에게 즐겨 회자膾炙된 시이고, 화사畵師들은 이 정경을 그려보려고 애를 쓰기도 한 시이다. 물론 그 정신적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산두선실괘승의 山頭禪室掛僧衣
창외무인수조비 窗外無人水鳥飛
황혼반재하산로 黃昏半在下山路
각청천성연취미 却聽泉聲戀翠微
산봉우리 암자에는 선승의 옷만 걸려 있고,
인적 없는 창밖에는 물새들이 날아가네.
내려오는 산길에 해는 이미 반쯤 기울어 가고,
들려오는 샘물 소리에 푸르스름한 산빛 정겹기만 하네.
그 옛날 이 깊은 산골짜기에 난야蘭若를 마련하고 당나라에서 배워온 선법禪法을 펼쳤으니, 이름하여 동리산문桐裏山門이다. 우리의 주인공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惠徹(=慧徹=慧哲=惠哲, 785~861, 도당 유학: 814~839) 화상은 왕경인 경주 출신이지만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외진 곳에 산문을 열었다.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북산北山 즉 설악雪岳에 자리를 잡고 도의道義(=道儀 ?~?, 도당 유학: 784~821) 선사와 염거廉居(=廉巨, ?~844) 선사가 산문을 열고 선법을 조용히 펼쳐간 것과 흡사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일러 마귀의 말(마어魔語)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하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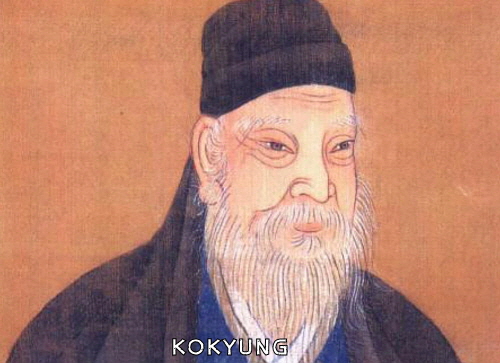
때는 통일신라시대의 후기로 돌아간다. 혜철 선사는 도의 선사보다 뒤인 814년에 당나라(618~907)로 건너가 도의 선사처럼 천하의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의 제자 서당지장西堂智藏(735~814) 선사를 찾아가 공부를 하였다. 혜철 화상이 당나라로 건너갔을 때에는 신라에는 아직 남종선이 전파되기 전이었고, 당나라에서 남종선을 공부하고 귀국한 선사도 아직 없었다. 그래서 혜철 선사가 당나라로 건너갔을 때는 당나라 선종의 구체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를 공부하려고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남종선을 처음 신라에 가지고 온 도의 선사가 귀국한 때는 821년인데, 귀국 후 그는 화엄종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왕경 지역에는 선종이 수용되기 어려워 설악산에서 조용히 법을 전하고 있었다. 10년 이상 당나라에서 공부한 후 신라에 실상산문實相山門을 열게 되는 증각선사證覺禪師 홍척洪陟(?~?, 도당 유학: ?~826) 화상이 귀국한 때는 826년이다. 혜철 선사가 당나라로 건너갔을 때는 도의 선사나 홍척 화상이 모두 지장 선사 문하에서 배우고 여러 선사들을 만나고 있을 때였으니 중국에서 이들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도의 선사나 홍척 선사도 중국 전역의 선문을 참방할 때라서 이들이 실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혜철 선사는 신무왕神武王(김우징金祐徵, 재위 839.4.~7.)이 즉위한 839년에 25년간의 당나라 유학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신라 말의 왕위쟁탈전관 정치적 혼란
그 당시 신라는 왕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져 나라가 온통 난장판이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 옛날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었다. 제45대 신무왕은 즉위 후 반년도 되지 않아 죽었다. 그 이전인 836년에 그는 조카 김예징金禮徵, 김주원의 후손 김양金陽(808~857) 등과 힘을 합쳐 후사後嗣가 없이 죽은 제42대 흥덕왕興德王(재위 826~836)의 빈자리에 원성왕의 손자인 그의 아버지 김균정金均貞(?~836)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김인겸金仁謙(750?~791?)의 손자 김명金明(817~839), 이홍利弘, 배훤백裵萱伯 등의 지지를 받던 김제륭金悌隆(=김제옹金悌邕, ?~838) 세력과 적판궁積板宮 전투에서 싸운 끝에 패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 김균정은 이홍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잔존세력은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장보고張保皐(?~846)의 보호를 받았다. 김제륭은 김헌정金憲貞의 아들이다.

김명 등의 지지를 받은 김제륭이 제43대 희강왕僖康王(재위 836~838)으로 등극하였으나, 즉위 3년째 상대등 김명과 시중 이홍 등이 군사를 일으켜 왕의 측근들을 살해하자 왕은 고립무원인 상황에서 왕궁에서 목을 매고 생을 마쳤다. 신라의 원감대사圓鑑大師 현욱玄昱=玄旭(788~869, 도당 유학: 824~837) 화상이 마조도일의 제자 장경회휘章敬懷暉(754~815)에게서 법을 전수받고 837년 4월에 왕자 김의종金義琮을 따라 귀국하였으니, 이때가 희강왕 2년 때의 일이다. 김의종은 문성왕(김경응金慶膺, 재위 839~857)의 7촌 숙부인데, 당시 김제륭파와 김우징파 간의 왕위쟁탈전에서 밀려나 836년에 당나라로 파견되어 사실상 강요된 숙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하튼 이런 난장판에서 상대등 김명이 22세로 왕권을 차지하였으니 그가 제44대 민애왕閔哀王(재위 838~839)이다. 그런데 김명의 누이 2명이 각각 김균정, 김제륭과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김균정도 그의 매형이고 그 조카인 김제륭도 그의 매형이었다. 매형 집안들끼리 혈투를 벌인 것인데, 그는 김제륭의 편에 가담하여 다른 매형인 김균정의 집안과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김명은 원성왕元聖王(김경신金敬信, 재위 785~798)의 장자 김인겸의 아들인 김충공金忠恭(?~835)과 귀보부인貴寶夫人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는데, 남매간에 근친혼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었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이 귀보부인을 박씨라고 기록하였다. 왕좌에 있는 사람을 두고 자매끼리의 근친혼에 의한 소생이라고 기록하기가 차마 어려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김인겸의 형제로는 김의영金義英과 김예영金禮英이 있었는데, 모두 일찍 죽어 왕위를 잇지 못하였다. 그러자 김인겸의 맏아들 김준옹金俊邕이 제39대 소성왕昭聖王(=昭成王, 재위 799~800), 둘째 아들 김언승金彦昇이 제41대 헌덕왕憲德王(재위 809~826), 셋째 아들 김수종金秀宗(=김경휘金景徽)이 제42대 흥덕왕으로 차례로 왕위에 올랐고, 넷째 아들인 김충공은 상대등이었지만 흥덕왕보다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 김충공의 아들이 김명이다.
제40대 왕은 애장왕哀莊王(김청명金淸明=김중희金重熙, 재위 800~809)인데, 소성왕의 아들로 13세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숙부인 병부령兵部令 김언승이 섭정을 하였다. 그런데 김언승은 섭정 9년 만에 동생 김수종, 6촌 동생 김제륭 등과 함께 난을 일으켜 애장왕과 왕의 동생 김체명을 함께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숙부들이 합세하여 조카들을 죽여 버렸다. 당나라 황제에게는 이들이 병으로 죽었다고 알렸다.
민애왕이 즉위한 해인 838년 2월에 반대파인 김양이 병사들을 모아 청해진으로 가서 김우징과 거사를 도모하였다. 드디어 3월에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왕경으로 진군하며 전투를 벌였고, 839년 1월에는 민애왕이 친히 지휘하던 왕군王軍을 격파하였다. 월유택月遊宅으로 달아난 민애왕은 군사들에 의해 살해되고 김우징의 거병은 성공하여 김양 등의 추대로 김우징이 신무왕이 되었다. 그러나 신무왕은 3개월 만에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이 제46대 문성왕文聖王(김경응金慶膺, 재위 839~857)으로 즉위하였다. 이 해에 혜철 화상이 신라로 귀국하였다. 그보다 2년 전에 귀국한 현욱 화상은 남악 실상사實相寺로 가서 머물다가 민애왕이 죽고 문성왕이 즉위한 후인 840년에는 여주 혜목산惠目山 고달사高達寺로 와서 주석하고 있었다.
841년부터 반대파의 귀족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조짐이 생겨났고, 당나라 무종武宗(재위 840~846) 황제가 문성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이 당시 당나라에는 무종이 회창법난會昌法難(842~846)을 일으켜 불교의 씨를 말리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신라승들도 그 영향을 받아 대거 귀국하였다. 혜철 선사의 뒤를 이어 당나라로 갔던 통효대사通曉大師 범일梵日(도당 유학: 821~840) 화상과 염거 선사의 제자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도당 유학: 837~840) 화상은 840년에, 낭혜대사朗慧大師 무염無染(도당 유학: 821?~845) 화상은 845년에, 철감선사澈鑒禪師 도윤道允(798~868, 도당 유학: 825~847) 화상은 847년에 각각 신라로 돌아왔다.
845년에 문성왕은 아버지 신무왕과 장보고 간의 약속대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려고 했으나, 섬사람을 천하게 여긴 귀족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진압하러 나선 토벌군의 염장閻長에게 암살을 당하였다. 그 후에도 반대 세력들의 반란이 있었고, 이를 진압하면서 왕권을 유지하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태자가 먼저 사망하여 숙부 즉 김균정의 아들이자 김우징의 이복동생인 김의정金誼靖(=김우정金祐靖, ?~861)이 제47대 헌안왕憲安王(?~861, 재위 857~861)으로 즉위하였다. 그도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5년 만에 사위인 김응렴金膺廉(846~875)에게 임금 자리를 넘기고 병으로 죽었다. 김응렴이 왕으로 즉위하니 그가 제48대 경문왕景文王(재위 861~875)이다.
왕위쟁탈전으로 막을 내린 신라 왕조
863년에 팔공산八公山 동화사桐華寺 비로암毘盧庵에 민애왕의 명복을 기원하고 추숭하는 사리함을 넣은 3층석탑이 세워졌다. 비로암은 민애왕의 원당이었다. 이 탑은 경문왕의 발원으로 세워진 것인데, 경문왕은 민애왕에게 죽임을 당한 희강왕의 손자였지만 피를 흘리는 싸움으로 갈가리 찢겨진 진골귀족들을 화합시키고자 이 원탑願塔을 세웠다. 그의 재위기간 중에도 지방호족들의 반란이 그치지 않았고 왜구들도 침입을 하였으나 이를 잘 토벌하였고 당나라와는 긴밀한 교류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탑을 건립할 때, 동화사에 주석하고 있었던 심지心地 화상이 탑의 건립에 전지대덕專知大德으로 참여하였다. 헌덕왕의 아들 여부로 논란이 있는 그 심지 화상이다. 『삼국사기』에는 헌덕왕에게는 “후사가 없다(無後嗣)”고 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헌덕왕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후사가 없다고 한 것은 출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출가의 원인은 아버지 김언승과 삼촌인 김수종이 합세하여 그의 사촌인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보고 삶에 회의를 느꼈고, 이러한 왕 자리를 자신이 넘겨받는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만일 심지 화상이 헌덕왕의 아들임이 사실이라면 그는 애장왕뿐만 아니라 민애왕인 김명과도 사촌형제가 된다.

이러한 것이 신라 후대 원성왕계의 자손들이 벌인 왕위쟁탈전의 장면이다. 이 왕위쟁탈전은 김인겸의 맏아들이 소성왕으로 즉위하면서부터 인겸계와 예영계 사이에 벌어진 것이었다. 좁게 보면, 인겸계의 김충공과 예영계의 김헌정, 김균정 3파 간의 싸움이었다. 「소성왕-애장왕-헌덕왕-흥덕왕」은 인겸계의 왕들이고, 김예영의 맏아들 김헌정의 아들인 김제륭이 김인겸의 손자 김명과 합세하여 김예영의 둘째 아들 김균정과 그 아들 김우징의 부자세력을 제압하고 왕이 된 「희강왕-민애왕」은 예영계와 인겸계의 연합이었다. 김우징과 김양이 다시 이 연합세력을 격파하면서 시작된 「신무왕-문성왕-헌안왕」은 예영계의 균정계였다. 헌안왕이 후사가 없어 희강왕의 손자 경문왕으로 넘어가면서 「경문왕-헌강왕-정강왕-진성여왕-효공왕」은 다시 헌정계가 왕위를 계승한 계보이다.
효공왕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자 헌강왕의 사위이자 효공왕의 자형인 박경휘朴景暉가 제53대 신덕왕神德王(재위 912~917)으로 되면서 김씨 왕조는 막을 내리고 다시 박씨 왕조가 시작되어 「신덕왕-경명왕景明王(박승영朴昇英, 재위 917~924)-경애왕景哀王(박위응朴魏膺, 재위 924~927)」으로 이어졌다. 경주를 공격한 후백제 견훤甄萱(867~936, 후백제 국왕 재위: 892?~935)에 의해 경애왕은 포석정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고, 그의 이종사촌인 김부金傅가 견훤에 의해 경순왕敬順王(재위 927~935)으로 세워지면서 박씨 왕조도 끝났다. 이 경순왕이 임해전臨海殿에서 왕건王建(877~943)을 만나 투항하면서 신라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였고, 삼국통일의 위업으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신라는 왕위쟁탈전으로 인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말이다.
국가든 개인이나 기업이든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있기 마련이고, 붓다의 가르침에 의하면 만물만사萬物萬事가 모두 성주괴공成住壞空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겸손과 노력이 있으면 수성守成을 오래 유지하거나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만과 자만에 빠져들면 권력이든 재력이든 능력이든 일찍 쇠망하고 무너지게 된다. 창업創業도 어렵지만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은 이런 이치이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자만과 오만으로 스스로 파괴되고 사라지는 현상을 늘 목도하고 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에게는 사유의 능력이 있기에 성찰을 통하여 겸손과 절제를 터득하면 그나마 다행이리라.
유학에서도 탐구자가 궁극에 도달하는 경지가 ‘경敬’이고, 『주역周易』에서도 겸괘謙卦의 괘사卦辭에서 “겸은 형하니, 군자는 유종한다[謙, 亨, 君子有終].”고 밝혀 놓은 이치이다. 정이천程伊川(1033~1107) 선생은 이를 설명하면서, “소인小人은 욕망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다투고 덕德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내 자랑하니, 비록 겸손하려고 해도 자연스레 행하지도 못하며, 굳게 지키지도 못하여 결국 삶의 끝마무리를 하지 못한다[在小人 則有欲必競 有德必伐, 雖使勉慕於謙 亦不能安行而固守 不能有終也].”라고 했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光陰莫虛度]
중국선 이야기 56_ 법안종 ❸ 법안종을 세운 문익은 청원계를 계승한 나한계침羅漢桂琛의 “만약 불법을 논한다면, 일체가 드러나 있는 것[一切現成]이다.”라는 말로부터…
김진무 /
-

불생선의 주창자 반케이 요타쿠
일본선 이야기 23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불교는 실질적인 경쟁자이자 동반자다. 유교는 불교로 인해 내면세계를 더욱 강화했고, 불교는 유교로 인해 현실 감각이 깊어진다.…
원영상 /
-

신라 말의 정치적 혼란과 선법의 전래
태안사 ❶ 태안사泰安寺는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에 있다. 죽곡면에서 태안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태안사 계곡으로 접어들어가면 동리산桐裏山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종섭 /
-

원력願力으로 만드는 세상
세계성취품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름밤, 하늘을 가득 채운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법한 질문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 그 질문 앞에 서 있…
보일스님 /
-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출간 외
서종택 시인의 책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봉정식 서종택 시인의 선禪 에세이집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출간 기념 봉정식이 지난 9월 20일 대구 정혜사 문수전에서 열…
편집부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