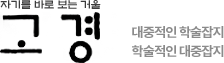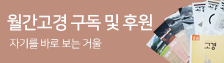[선어록의 뒷골목]
자전거를 타는 들꽃
페이지 정보
장웅연 / 2016 년 6 월 [통권 제38호] / / 작성일20-05-22 08:32 / 조회3,967회 / 댓글0건본문
미니멀리즘이 유행이다. 그러나 환경이 단조로울수록 잡념은 더 많아진다는 역설. 벽을 보고 오래 서 있으면 미쳐버리기 십상인 이치와 같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이나, 살아온 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도 용기다. 누구에게든 그의 업(業)에 걸맞은 과오와 좌절이 있는 법이다. 잘못 살아온 것 아닐까하는 의심이 정말 잘못 살게 한다. 반성은, 망상이다. 아무 데서나 피는 들꽃은 언제 어디서도 최고가 아니었으나, 언제 어디서나 최선이었다.
인간이 밥을 먹는 까닭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이유도 마찬가지. 불면증에 시달리든 양질의 수면을 위해 병원에 돈을 투자하든, 결국엔 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아가는 이유 역시, 죽네 사네 속을 끓여도 기어이 살 수밖에 없도록 생명은 설계되어 있다. 삶에는 이유가 없다.
그저 살아지니까, 살아가는 것이다. 대개 이유를 찾으려다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끝내 자살에 손을 댄다.

진정한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삶인가. 간명하게 말하자면 전자는 욕망이고 후자는 현실이다. 이미 답은 나온 셈이다. ‘가뭄에 콩 나듯이’라는 속담의 역설적 의미는 가뭄에도 콩은 난다는 것이다. 세월은 절대 생명을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 반성할 시간에 도전하는 것이, 매정한 세월에 대처하는 도리다. 침울하거나 억울할 때마다, 이놈의 비루한 육신을 거둬 먹이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헤모글로빈을 생각한다.
제51칙 법안의 뱃길과 물길(法眼舡陸, 법안강륙)
법안문익(法眼文益)이 각상좌(覺上座)에게 물었다. “배로 왔는가, 뭍으로 왔는가?” “배로 왔습니다.” 법안이 다시 물었다. “배는 어디에 있는가?” “강에 있습니다.” 법안이 옆에 있던 승려에게 물었다. “말해봐라. 과연 저 자가 안목을 갖춘 것 같으냐, 아닌 것 같으냐?”
며칠 전부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나를 떠받치는 동시에 나를 빨아들이며 달려가는 부력과 인력의 조화는 정답다.
집에 돌아오면 놓아둘 데가 마땅치 않아, 집 안까지 끌고 들어온다. 그보다는 누가 훔쳐갈까 걱정돼서다. 현관 앞에서, 내 소유(所有)의 선두(先頭)에서, 나의 노동과 근력을 증거하고 있는 검은 몸뚱이를 보고 있으면 뿌듯하다. 그리고 내일 다시 그럴 것이기에 설렌다.
교외별전(敎外別傳) 간두진보(竿頭進步). 선가(禪家)에선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사다리는 버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법열(法悅)을 맛본 자는 사다리가 만능인 양 집착하거나, 남들이 자신의 경지에 침범할까 전전긍긍하게 마련이다. 한편으론 사다리가 있어야, 지금 처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디든 훌훌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닐는지. 강가에 묶어둔 배는 오랫동안 집을 지킨 개처럼 듬직하다.
지하철로 다니던 길을 자전거로 다닌다. 돈이 덜 드는 대신 힘이 더 든다. 물론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보람이 있다. 달리다보면, 날아갈 것도 같다. 먹어야 한다는 본능과 벌어먹어야 한다는 책임을 잊게 되고, 자잘한 걱정들은 만춘(晩春)의 꽃가루로 흩날린다. 그리하여 안목이란 뼈대라기보다는 날개다. 백점을 맞고 싶다는 마음을 빵점을 맞겠다는 마음으로 치환할 수 있는 이 순간, 나는 별의 남편 바람의 스승. 마음에도 자전거 한 대 사줘야겠다.
제52칙 조산의 법신(曹山法身, 조산법신)
조산본적(曹山本寂)이 덕(德) 상좌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사물에 응하되 형상을 나타냄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어떻게 하면 이 도리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덕상좌가 답했다. “노새가 우물을 엿보는 격이겠지요.” 조산이 말했다. “그럴듯하긴 한데, 아직 2할이 모자라다.” 이번엔 덕상좌가 물었다. “화상께선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우물이 나귀를 엿보는 것과 같다.”
노새가 우물을 엿보는 까닭은, 목을 축이기 위해서다. 우물은 무엇을 보았든, 잡아먹지 않는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살의 삶이다.
제53칙 황벽의 술지게미(黃蘗噇糟, 황벽당조)
황벽희운(黃蘗希運)이 법상에 올라 꾸짖었다. “그대들은 모두 술지게미나 씹는 꼰대들이다! 그렇게 살아서야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나라 안에 도무지 선사(禪師)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있는가?” 이에 어느 승려가 나서서 따졌다. “그렇다면 지금 전국에서 무리를 이끌고 대중을 교화하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황벽이 말했다. “내가 선(禪)이 없다고 했냐. 선사가 없다고 했다.”
『선문염송』에는 황벽과 배휴(裵休)의 일화가 실렸다. 고위 관리이자 재가수행자였던 배휴가 어느 날 절을 찾았다. 법당에 걸린 고승들의 진영을 보고는 괜히 심술이 났다. “이 초상화들은 무엇이오?” 절의 살림을 맡아보는 원주(院主) 스님이 답했다. “큰스님들의 초상화입니다.” “그림은 볼 만한데 도대체 큰스님들은 어디에 계시오?” 과연 큰스님이라 받들 만한 인물들인지 의심스럽다는 빈축에, 원주는 말문이 막혔다.
득의양양해진 배휴는 “여기 참선하는 스님이 있기는 하느냐?”며 또 한 번 이죽거렸다. 원주가 황벽을 추천해 그에게 갔다. 배휴는 원주에게 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황벽의 속을 긁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황벽은 느닷없이 “상공(相公).”하고 배휴를 불렀다. “예.” 배휴가 대답을 하자 황벽이 어디에 물었다. “상공은 어디에 계시오?”
53칙은 배휴를 만나고 난 뒤에 있었던 법문으로 추측된다. “본래면목을 깨닫지 못한 배휴 당신도 별 볼일 없는 인간”이라며 멋지게 한방 먹이긴 했으나, 아무래도 시원찮은 승가의 현실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얼마나 깨우친 도인이 드물면 바깥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겠느냐며 제자들의 정진을 독려하는 품새다. 웃전이 먹다 남긴 술잔이나 탐하지 말고 직접 담가 마시란다.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욕먹고 일하고 싸고 자고 먹고 욕먹는 일생은 일생이어도 무생(無生)이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뿐. 평생을 살았어도 살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삶이란 무의미와의 지난한 싸움인 것이다. 육신은 유한해도 법신은 영원하다고 했다. 어떻게든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고 남에게 결실이 되는 무언가를 기어이 남겨야 한다. 비록 그것이 싸구려라도 절망이라도 심지어 헛것이더라도. 자꾸만 배를 뚫고 나오는 ‘마음의 소리.’ ‘집 나간 집’의 행방을 쫓는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가야산에 흐르는 봄빛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지난 2월 16일 백련암에서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동참 속에 갑진년 정초 아비라기도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저마다 간절한 서원 속에 한 해를 밝힐 공덕을 쌓아 …
원택스님 /
-

기도는 단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방편인가?
참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선이란 수행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행법 중에 “오직 참선만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나머지 다른 수행법들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
일행스님 /
-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이 잔잔한 기쁨이 물결칩니다. 숙소는 64층인데,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대체로 솔개의 눈으로 …
서종택 /
-

말법시대 참회법과 석경장엄
『미륵대성불경』에서 말하길, 미래세에 이르러 수행자가 미륵에게 귀의하고자 한다면 먼저 과거칠불에게 예배하고 공양하여 과거업장이 소멸되고 수계를 받아야 한다. 신라시대부터 일반 대중은 연등회와 팔관회…
고혜련 /
-

봄나물 예찬
바야흐로 들나물의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주 작은 주말농장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24절기에 늘 진심입니다. 『고경』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하곤 했지만 절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박성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