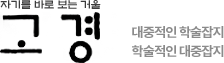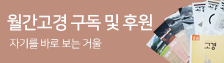[선시산책]
물 위의 진흙소가 달빛을 갈고
페이지 정보
백원기 / 2019 년 8 월 [통권 제76호] / / 작성일20-05-29 10:28 / 조회5,313회 / 댓글0건본문
백원기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문학평론가
어머니가 신승神僧으로부터 대승경을 받는 태몽을 꾸고 태어난 소요태능(1562~1649)은 13세에 장성 백양산에 놀러갔다가 그곳의 수려한 경치에 매료되어 출가를 결심하였다. 진대사에게 출가, 수계 득도한 그는 속리산과 해인사를 오가며 교화를 펴고 있던 부휴 선수(1543~1615)로부터 경과 율장을 배웠다. 그 후, 묘향산의 청허 휴정(서산)의 문하에 들어가 20년 동안 공안참구 끝에 깨달음을 얻고 법을 이어 받았으며, 만년에는 지리산 연곡사에 머물며 교화에 전념하다가 세수 88세, 법랍 75년으로 원적에 들었다.

일체의 깨달음은 누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전에서도 찾을 길 없다. 오직 자기 자신 속에서 직관적인 깨달음[득도得道]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매한 중생은 집안에 있는 봄을 모르고 멀리 찾아 헤매듯이 허상을 쫓아 그것을 향해 질주한다. 하지만 선사들은 구도와 깨달음의 과정에서 자성을 찾아 고행을 멈추지 않는 수행자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태능의 다음의 시는 ‘지금, 여기’의 본래면목을 잊고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몽매함을 일깨워 준다.
우습구나, 소를 탄 자여, 가소기우자可笑騎牛子
소를 타고서 다시 소를 찾는구나. 기우갱멱우騎牛更覓牛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작래무영수斫來無影樹
바다의 거품을 모두 태워버렸네. 소진해중구銷盡海中漚
선가에서는 자성을 찾는 것을 소를 찾는[尋牛]일에 비유한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은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찾는 것과 같다. 선사는 소를 탄 채 소를 찾는 어리석음 음 경책하고 있다. 소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작 자신이 타고 있었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도는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본각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토끼의 뿔이나 거북의 털처럼, ‘그림자 없는 나무’는 형상이 없는 마음이다. 즉 번뇌와 망념에 물들지 않는 ‘본래심’을 형상화한 것이다. ‘바다의 거품을 모두 태워버렸’다는 대목은 마음속의 번뇌 망상이 ‘붉은 화로 속의 한 점 눈송이[홍로일점설紅爐一點雪]’처럼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실로 태능 선시의 백미이다.
이처럼 선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이 드러낼 경우 비정상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여 선사들은 부정과 모순어법에 의한 역설로, 비현실적 초월적 상징의 언어, 즉 그림자 없는 나무〔무영수無影樹〕, 뿌리 없는 나무〔무근수無根樹〕, 진흙 소〔니우泥牛〕, 나무 말〔목마木馬〕, 돌 여자〔석녀石女〕, ‘철 나무에 피는 꽃〔철수개화鐵樹開花〕’ 등 존재하지 않는 격외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다음의 시 역시 이러한 격외의 본분소식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물 위 진흙소가 달빛을 갈아엎고 수상니우경월색水上泥牛耕月色
구름 가운데 나무 말이 풍광을 이끄네 운중목마철풍광雲中木馬掣風光
옛 부처의 곡조는 허공의 뼈다귀요 위음고조허공골威音古調虛空骨
외로운 학 울음소리 하늘 밖으로 퍼지네 고학일성천외장孤鶴一聲天外長
‘진흙 소’는 물에 바로 녹아 버리는 존재로, 물 위에 비치는 달빛을 갈아엎을 수 없다. 아울러 구름 속의 ‘나무 말’이 풍광을 이끈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허공의 뼈다귀’ 또한 허상이다. 이러한 선어들은 ‘본래의 나’ 즉, 불성을 비유한 것이다. 결국 허상을 깨고 허상을 떠나야 실상을 볼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마지막 시행, ‘하늘 밖 외로운 학의 울음’은 고독한 산승의 깨달음의 사자후일 것이다. 태능의 이러한 격외언어의 시적 묘미는 다음의 시에서 한결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 일주무영목一株無影木
불 속에 옮겨 심었네 이취화중재移就火中栽
봄비가 오지 않아도 불가삼춘우不假三春雨
붉은 꽃 어지럽게 피어나네 홍화난만개紅花爛漫開
일상적인 사유체계를 초월한 선적 묘사로, ‘일선화一禪和에게 답한 게송이다. ‘무영목’은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파괴되지 않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상징한다. 화자가 불 속에 이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은 중생들이 번뇌와 욕망의 불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무[보리수]는 음양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림자가 없고,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는다. 때문에 물이 없어도 이 나무는 자란다. 물론 계절에 따라 피는 꽃도 아니다. 하여 봄비도 필요 없고 훈풍도 필요 없으며, 햇빛도 필요 없다. 하지만 번뇌와 욕망의 불길 속에서도 깨달음의 꽃은 언제나 아름답고 붉게 피어난다는 것이다. 선지가 번뜩이는 압권의 시편이다.
불가에서 달의 이미지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중국 선종 제3조 승찬은 ‘원동태허 무결무여圓同太虛 無缺無餘’로 달의 상징성을 말하고 있다. 지극한 도는 원융하고 걸림이 없어 둥글기가 허공과 같고,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이 절대무한의 진리가 원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 원의 대표적인 상징체가 달이다. 지리산의 신흥사와 연곡사를 중건했던 태능은 연곡사 향각香閣에 제題한 시에서 진리의 본체를 찾는 길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모든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아서 백천경권여표지百千經卷如標指
손가락 따라 마땅히 하늘의 달 보아야 하네. 인지당관월재천因指當觀月在天
달 지고 손가락도 잊으면 아무 일도 없나니 월락지망무일사月落指忘無一事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네. 기래끽반곤래면飢來喫飯困來眠
달은 진리 또는 본질을 상징하고, 손가락은 경전 또는 수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사들은 수단이나 도구에 집착하지 말고 목적이나 본질을 추구해야 함을 설파했다. 이 시의 진면목은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에 있다. 수많은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과 같기에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 달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달을 찾았으면 이제는 손가락을 잊어야 한다. 손끝과 달을 모두 잊은 경지가 여여한 법체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경전을 넘어 선에 들어가야 ‘깨달음’에 이른다는 메시지가 선명히 드러나 있다. 이처럼 선이 강조하는 것은 분별, 조작, 시비를 떠나는 평상심이다. 사량 분별을 버리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듯 일상사로 되돌아옴이 바로 삶의 실체요, 그것이 모든 법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천연스러운 일상생활, 이는 곧 화엄의 묘용이기도 하다.
심산유곡은 수행자들에게 더 없는 깨달음의 도량이었고, 그러한 자연과의 교감은 한결 세외지미世外之美의 깊은 향기를 발한다. 태능의 시적 세계에서도 자연은 단지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연과 합일을 추구하는 이상이며 그 자신의 해탈의 경계로 표상된다. 흰 구름, 푸른 산, 석양을 받으며 돌아오는 새, 목련꽃, 계곡물 등을 통해 반야의 무정설법을 듣고 자비로운 문수보살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흰 구름 끊긴 곳 푸른 산이요 백운단처시청산白雲斷處是靑山
해가 지는 하늘가 새는 홀로 돌아오네 일몰천변조독환日沒天邊鳥獨還
세월 밖의 자비로운 모습 언제나 뵈오니 겁외자용상촉목 劫外慈容常觸目
목련꽃 피는 날에 물은 졸졸 흐르네 목란화발수잔잔木蘭花發水潺潺
‘글자 없는 책’을 펼치며 소요자재하며 살아가는 태능의 공적한 마음의 경지가 잘 드러나 있다. 흰 구름이 걷히면 푸른 산이 드러나고, 해가 지면 돌아오는 새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산승이다. 늘 뵙는, 시공을 초월한 문수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은 산승으로 하여금 탈속한 원융의 세계에 들게 한다. 목련은 나무에 핀 연꽃으로, 그 향기가 십리까지 퍼진다하여 목란木蘭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목련꽃 피는 봄날, 산승은 잔잔하게 흘러가는 계곡물에서 무정설법을 듣는다. 이러한 자연이 바로 설선당說禪堂이고 선열당禪悅堂이다. 이처럼 태능은 담담하고 고요하게 자신을 자연과 합일함으로써 틈이 없는 원융세계를 획득하고 있다.
저작권자(©) 월간 고경.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뉴스
-

가야산에 흐르는 봄빛을 몇 번이나 보았던가!
지난 2월 16일 백련암에서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동참 속에 갑진년 정초 아비라기도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저마다 간절한 서원 속에 한 해를 밝힐 공덕을 쌓아 …
원택스님 /
-

기도는 단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방편인가?
참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선이란 수행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행법 중에 “오직 참선만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나머지 다른 수행법들은 참선을 잘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
일행스님 /
-

얼굴 좀 펴게나 올빼미여, 이건 봄비가 아닌가
여행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이 잔잔한 기쁨이 물결칩니다. 숙소는 64층인데, 내려다보는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대체로 솔개의 눈으로 …
서종택 /
-

말법시대 참회법과 석경장엄
『미륵대성불경』에서 말하길, 미래세에 이르러 수행자가 미륵에게 귀의하고자 한다면 먼저 과거칠불에게 예배하고 공양하여 과거업장이 소멸되고 수계를 받아야 한다. 신라시대부터 일반 대중은 연등회와 팔관회…
고혜련 /
-

봄나물 예찬
바야흐로 들나물의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아주 작은 주말농장을 통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24절기에 늘 진심입니다. 『고경』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하곤 했지만 절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박성희 /
※ 로그인 하시면 추천과 댓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